[2025 영 디자이너] 디자이너 편서희, 심연서
디자인플러스는 올해 11월 서울디자인페스티벌(이하 SDF)에 참가하는 영 디자이너 프로모션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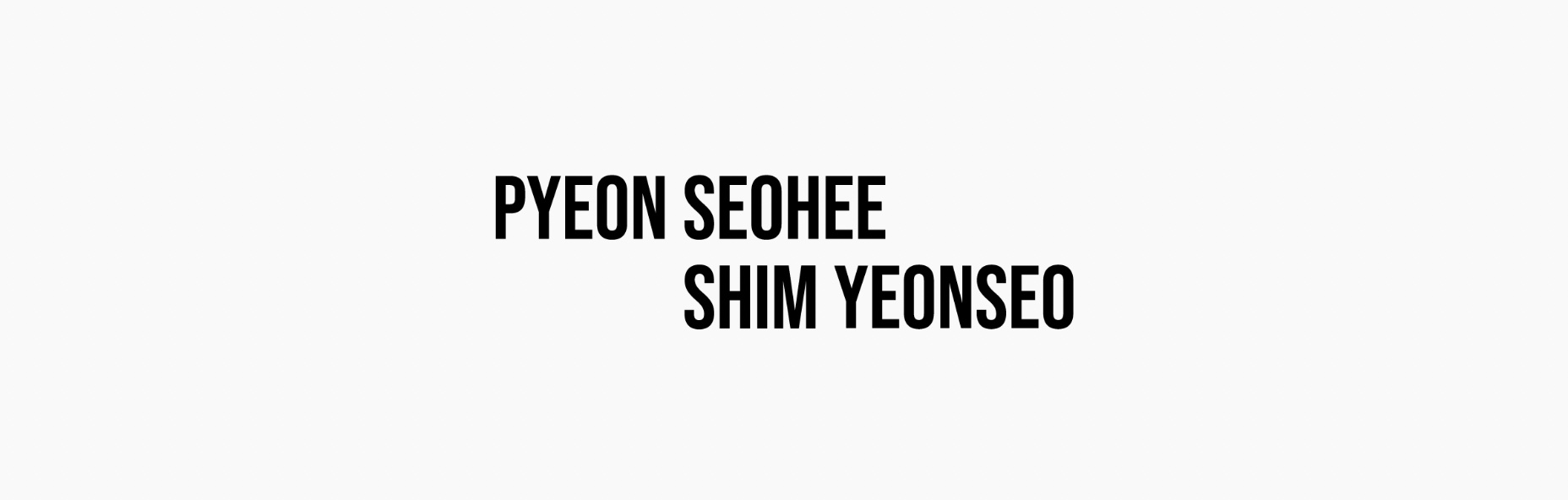
23년간 1000여 명의 신진 디자이너들을 배출한 SDF 영 디자이너 프로모션은 명실상부 디자이너의 등용문이다. 디자인플러스는 내일의 주인공이 될 이들을 소개한다.
![[2025 영 디자이너] 디자이너 편서희, 심연서 1 20251107 085627](https://design.co.kr/wp-content/uploads/2025/11/20251107_085627-832x1248.jpg)
올해 영 디자이너 프로모션에 참여한 계기가 무엇인가?
우리는 두 살 차이의 친구로, 매주 만나 디자인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스터디라 부르기엔 애매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담론이었다. 서로의 영감과 레퍼런스를 나누던 중, 작년에 방문했던 서울디자인페스티벌의 영 디자이너 전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때 ‘우리도 이번 해에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싹텄고, 지금까지의 실험과 사유를 현실로 옮길 무대로 2025 서울디자인페스티벌을 선택했다.
두 사람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의기투합한 배경도 궁금하다.
편서희는 이화여자대학교 3학년, 심연서는 2학년에 재학 중이다. 우리의 만남은 학교 밖에서 시작되었다. 서로를 알기 전, 이미 각자의 전시를 통해 서로의 작업을 본 적이 있었다. ‘저런 인재가 우리 학교에 있을 줄이야.’ 그렇게 품었던 인상이 새 학기 동아리에서 현실로 이어졌다. 우리는 상업적 디자인보다 사유와 태도가 담긴 작업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했고, 의미와 형태가 공존하는 디자인을 지향하며 함께 작업을 시작했다.
![[2025 영 디자이너] 디자이너 편서희, 심연서 2 20251109 124405](https://design.co.kr/wp-content/uploads/2025/11/20251109_124405-832x550.jpg)
![[2025 영 디자이너] 디자이너 편서희, 심연서 3 20251109 124428 e1762692565772](https://design.co.kr/wp-content/uploads/2025/11/20251109_124428-e1762692565772-832x553.jpg)
작업 스타일에 대해 설명해 달라.
편서희는 작은 것에 신경 쓰는 디테일 광이고, 심연서는 저돌적인 불도저다. 예를 들어 함께 있는 작업실에서 편서희가 석고 조각을 다듬고 있다면, 심연서는 나무 망치로 나무를 부수고 있다. 생각도 성격도 180도 다르지만, 그래서 더 좋은 조합이라 생각한다. 작업을 하다 보면 너무 작은 것에, 또는 너무 큰 것에 몰입하기 쉽지만, 서로의 시야를 잡아주며 균형을 맞추는 사이가 되었다.
둘의 작업을 정의하는 키워드는?
편서희의 작업을 정의하는 키워드는 ‘片(조각 편)’이다. 본인의 성씨이기도 한 이 글자는 ‘조각, 쪼갠 조각, 한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한글에서는 ‘편지’, ‘단편’, ‘일편단심’으로 쓰인다. 편서희의 작업은 많은 경우 작은 조각에서 시작하며, 그것에 불빛을 다추는 조명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심연서의 작업을 정의하는 키워드는 ‘심연’ 그 자체이다. 심연서는 작업을 시작하기 전 의미를 생각하는 과정을 길게 가진다. 생각의 심연까지 들어갔을 때, 비로소 디자인적 사고로 전환이 가능하다. 디자인 자체에 심연의 의미를 담는 것, 그것이 내가 지향하는 디자인이자 심연서를 정의하는 키워드이다.
![[2025 영 디자이너] 디자이너 편서희, 심연서 4 20251109 125004](https://design.co.kr/wp-content/uploads/2025/11/20251109_125004-832x468.jpg)
![[2025 영 디자이너] 디자이너 편서희, 심연서 5 20251109 125010](https://design.co.kr/wp-content/uploads/2025/11/20251109_125010-832x468.jpg)
![[2025 영 디자이너] 디자이너 편서희, 심연서 6 20251109 125019](https://design.co.kr/wp-content/uploads/2025/11/20251109_125019-832x468.jpg)
작업에 주로 사용하는 재료가 있다면?
우리는 석고와 스틸을 사용한다. 석고는 편서희가 가구를 그대로 복제하는 데 사용하며, 2023년부터 조각과 몰드 캐스팅을 중심으로 작업해왔다. 이번 작품에서는 실리콘 몰드에 석고를 부어 반복 생산하고, 나열하는 방식으로 완성했다. 스틸은 심연서가 부서진 가구에서 새로운 형태를 확장하는 데 사용한다. 철의 견고함과 가능성에 매료되어 나무에서 철로 확장되는 형태를 통해 자연과 인공 사이의 틈을 좁혔다. 이렇게 석고와 스틸로 우리는 사물을 분열생식시킨다.
작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의 작업은 기존 디자인의 방법론에 속하지 않는다. 디자인의 틀 밖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제시한다. 1인 가구와 대학생이 밀집한 신촌에서, 우리는 버려진 가구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이걸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시작이었다. 한국의 가구는 한 공간에 머물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동하는 삶 속에서 소비되고 버려진다. 우리는 버려진 가구에 새로운 가능성을 부여하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