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과 탈네모꼴 옛 글자의 재해석
복각은 재현再現이다. 원형을 모방해 다시 판각한 것이다. 복각하는 행위와 폰트를 만드는 행위는 구별된다. 예를 들어 각자장刻字匠이 〈훈민정음해례본〉(이하 〈훈민정음〉)을 글자 그대로 다시 새겨서 목판을 만드는 일은 복각이고, 디자이너가 〈훈민정음〉에 인쇄된 글자를 디지털 폰트로 만드는 일은 재해석이다.

폰트 디자인은 기존 책에 없던 글자를 채워서 1만 1172자나 되는 한 벌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원형을 참고해 부족한 획을 추가하고 새겨지지 않았던 글자를 더 그리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디자이너의 재해석이 개입된다.



방方획과 필筆획의 활용
1446년 〈훈민정음〉 이후 출간한 〈용비어천가〉(1447), 〈월인천강지곡〉(1447)에서는 중성자를 점획이 아닌 선획으로 표현했고, 〈동국정운〉(1448)에서는 중성자를 점획으로 표현했다. 점획이 선획으로 변화하는 것은 글자를 쓰는 도구의 특성에 기인한다. 옛 글자를 복원할 때 글자 형태를 충실하게 따를 수도 있겠지만, 글자의 탄생 배경을 탐구하고 새로운 해석을 덧입혀보는 것도 방법이다. 훈민정음 창제 초기의 방획이 점차 필획으로 변하는 것은 ‘보기 문자’가 ‘쓰기 문자’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종은 새로 만든 글자를 기하학적인 방획으로 새겼다. 글자의 차별성을 시각적으로 극대화한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특히 방획 글자는 새로 만든 글자의 디자인 콘셉트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세종은 어째서 새로 만든 글자를 붓으로 쓰지 않고 기하학적인 방획으로 그린(새긴) 것일까. 세종은 서체를 선보인 것이 아니라 소리의 시각화 시스템을 보여준 것이다. 비유하자면 훈민정음은 건물이 아닌 설계도면인 셈이다. 건축물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설계도면은 다양성이 응축되어 있다. 건축물이 어떤 외형을 갖출지에 대한 여지가 열려 있다는 것이다. 훈민정음 역시 소리를 시각화한 ‘글자 설계도’라고 볼 수 있다. 〈훈민정음〉에 쓰인 글자는 ‘한자’와 창제된 문자인 ‘정음’, 두 가지다. 명조체로 쓴 한자는 당시 읽을 수 있는 문자였다. 그러나 새로운 모습의 활자인 정음은 아직 읽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북 디자이너 정병규는 신新 문자가 ‘읽기로서의 문자’라는 텍스트의 차원을 넘어 그것을 감싸면서 ‘보기로서의 문자’라는 활자적 차원을 도입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세종이 〈훈민정음〉이라는 책자의 발간과 최초의 한글 타이포그래피의 실천을 통해 ‘보여주기’라는 활자의 새로운 사용법과 새로운 기능을 제시했다고 설명한다. (참고: 정병규, 〈한글 문자학 입문〉, 2017, 미출간 원고)


탈네모꼴, 훈민정음의 적극적 재해석
한글의 기계화를 위한 타자기 글자 모양과 받침 글쇠 방식에서 한글 탈네모꼴을 고안한 것은 사실이지만, 탈네모꼴 폰트의 심미적·문화적 가치를 논할 때에는 한글의 본질적 특성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훈민정음을 실험적이고 급진적으로 재해석한 폰트가 등장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다. 한글 탈네모꼴 폰트는 한글 시스템 구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였다. 〈훈민정음〉의 ‘범자필합이성음凡字必合而成音’은 한글의 모아쓰기를 규정한 의미심장한 문장이다. 초성자와 중성자, 종성자가 반드시 합해져야 음절을 이룬다고 썼으니, 음절 문자로서의 한글의 핵심은 결국 모아쓰기다. 한글 기계화 과정에서 입력 속도를 고려한 풀어쓰기의 주장은 음절 문자로서의 체계성과 편리성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글자 입력의 효율성은 언중의 독서 편리성을 앞지를 수 없었다. 김정수는 모아쓰기 규범을 따르는 풀어쓰기 방법으로 ‘한글 기울여 풀어쓰기’를 소개하기도 했다.(김정수, 〈한글의 역사와 미래〉, 열화당, 1990) 이런 맥락으로 볼 때 탈네모꼴은 풀어쓰기와 모아쓰기(음절문자)의 합리적인 절충안이다. 모아쓰기가 정사각형 틀을 벗어나게 된 실마리는 다시 〈훈민정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은 종성자는 초성자를 다시 쓴다는 것이다. 이것을 형태적 관점으로 읽으면 종성자의 모양을 초성자와 동일하게 반복해서 사용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자연스럽게 지금의 탈네모꼴이 떠오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시각화 단서는 〈동국정운〉을 참고할 수 있다. 활자活字는 말 그대로 살아서(活) 이리저리 ‘움직이는(movable) 글자’라는 뜻이다. 분리와 결합이 자유로운 활자의 특성 외에 ‘회전’이 있다. 한글 중에는 180도 상하 회전이 가능한 글자가 있다. 목활자본인 〈동국정운〉은 1448년에 훈민정음을 사용해 만든 책으로, 이러한 특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글꼴 전문가 박병천은 동일 문자의 회전성에 대해 “〈동국정운〉에 나오는 초·중·종성 합자 중 180도 회전시켜 거꾸로 놓았을 때 가독성이나 조형성에 무리가 없는 문자를 찾아 그 특징을 찾아보았다(중략). 회전성이 있는 문자는 초·중·종성이 상중하로 결구된 것으로 초성자 ‘ㄱ·ㄴ·ㄹ·ㅁ·ㅍ·ㅇ’은 ‘ㄴ·ㄱ·ㄹ·ㅁ·ㅍ·ㅇ’으로, 중성자 ‘ㅡ·ㅗ·ㅛ·ㅜ·ㅠ’는 ‘ㅡ·ㅜ·ㅠ·ㅗ·ㅛ’로, 종성자 ‘ㄱ·ㄴ·ㅁ·ㅇ’은 ‘ㄴ·ㄱ·ㅁ·ㅇ’으로 바뀐다”라고 분석하며 동국정운체를 탈네모꼴 자형으로 개발하여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박병천, 〈한글 판본체 연구: 훈민정음·동국정운·월인천강지곡〉 일지사, 2000) 동국정운식 표기법과 목활자의 형태는 탈네모꼴 형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먼 옛날 이미 글자를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새로운 단어나 문장을 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실로 놀랍다.


동국정운식 표기법의 또 다른 특징은 음가音價• 없는 받침 글자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 책은 목활자본이기 때문에 모든 목활자의 크기가 똑같아야 했다. 음가 없는 받침을 만들어야 했던 이유일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초성, 중성, 종성을 모아쓰는 엄격한 형식미를 보여준다. 그런데 음가 없는 받침 글자를 지우면 종성자가 있던 곳에 빈자리가 생긴다. 받침의 빈자리는 이전까지 원칙으로 삼던 글자의 정방형을 깨트리는 단서가 된다. 필요에 따라 종성의 자리를 비우거나 채우면서 초성 글자를 종성에 다시 사용하는 것은 탈네모꼴 폰트의 합리적 형식미다.
이런 의미에서 안그라픽스가 첫닿자 19자, 홀자 21자, 받침 27자를 조합해 1만 1172자를 파생하는 세벌식 조합형 폰트로 제작한 ‘AG 안상수체’는 옛 서체를 훌륭하게 재해석한 사례다. 한글 자소는 수직선, 수평선, 사선, 정원 등 기하학적 형태로 구성되었으며 홀자의 기둥이 길게 뻗어 받침의 정가운데에 맞닿아 있다는 특징을 반영했다. 2014년 EBS는 훈민정음 반포 568돌을 기념하여 ‘EBS 훈민정음체’를 개발하고 무료 배포했는데 웹사이트에는 〈훈민정음〉에 인쇄된 글자의 기본형과 주요 특징을 유지하면서 단순화한 획과 선으로 디자인하여 글꼴의 가독성을 높이고 데이터를 줄여 모바일과 웹 환경에 최적화했다고 밝혔다. 이후 2016년 ‘EBS 훈민정음 새론체’를 배포했다. 기존 디지털 폰트에서 가독성을 보완하여 현대적으로 개선했는데, 모음자의 ‘모음꼬리’를 점이 아닌 선으로 바꾼 게 눈에 띈다.
•발음 기관의 어떤 기초적 조건에 의하여 생기는 소릿값.

소리글자로서의 한글은 알파벳의 장점을 갖추면서 동시에 사각형 안에 모아쓰는 음절 단위 글자의 편리함과 고유한 시각성을 보유하고 있다. 한글 탈네모꼴 폰트는 자소의 개수는 다소 적지만, 글자를 모아쓰는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전통적 기능성과 현대적 심미성을 동시에 지닌다. 앞으로 훈민정음 복원은 〈훈민정음〉을 복각하거나 비슷한 모양을 그리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훈민정음은 고정된 형태가 아니라 변화무쌍한 소리를 시각화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답은 언제나 〈훈민정음〉에 존재한다.
정재완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를 졸업한 후 정병규출판디자인과 민음사출판그룹에서 북 디자이너로 일했다. 글자에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타이포그래피와 북 디자인을 공부한다. 2008년 이래 개인전 〈글자 풍경〉을 네 차례 열었으며 〈동아시아 차세대 북 디자인〉전, 타이포잔치 등에 참여했다. 지은 책으로 〈세계의 북디자이너 10〉(공저), 〈아파트 글자〉(공저), 〈디자인된 문제들〉(공저), 〈낯선 골목길을 걷는 디자이너〉 등이 있다.
![[Creator+] 폰트 디자인 스튜디오 양장점: 제호에서 폰트로, 월간 〈디자인〉의 50주년을 설계하다 9 [Creator+] 폰트 디자인 스튜디오 양장점: 제호에서 폰트로, 월간 〈디자인〉의 50주년을 설계하다](https://design.co.kr/wp-content/uploads/2026/01/20260107_083924.jpg)
![[Creator+] 양장점의 A to Z: 기업 전용 서체부터 월간 〈디자인〉 50주년 기념 폰트까지 10 [Creator+] 양장점의 A to Z: 기업 전용 서체부터 월간 〈디자인〉 50주년 기념 폰트까지](https://design.co.kr/wp-content/uploads/2026/01/20260107_083944.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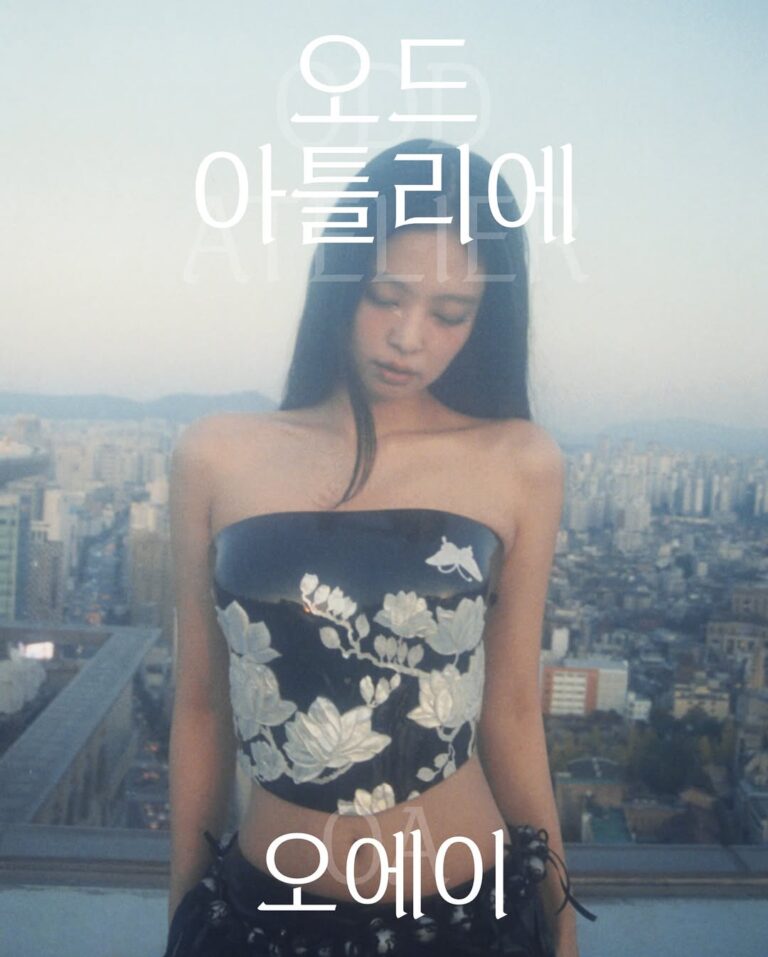
![[iF 디자인 어워드 2025 수상작]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 12 [iF 디자인 어워드 2025 수상작] 부여군 지역공동체활성화재단](https://design.co.kr/wp-content/uploads/2025/05/1-3-768x512.jpg)
![[위클리 디자인] 스포티파이부터 레딧까지, 브랜드들의 개성 넘치는 서체 디자인 13 [위클리 디자인] 스포티파이부터 레딧까지, 브랜드들의 개성 넘치는 서체 디자인](https://design.co.kr/wp-content/uploads/2024/10/%EC%84%9C%EC%B2%B4%EF%BC%91%EF%BC%8D%EF%BC%91-768x76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