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 팔 ‘파눅’과 함께 21세기 공예를 개척한다 디르크 판 데르 코이 (Dirk van der Kooij)
3D 프린팅이 디자이너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끝없이 흐름이 느린 의자(Endless flow low chair natural)는 끝없이 패턴처럼 이어지는 레이어의 연속이 아름다운 공예품과 공산품의 특성을 모두 담고 있다.
(우) 토실토실 의자
토실토실 의자(Chubby Chair)는 다른 가구보다 플라스틱을 더욱더 굵게 짜 만들었다

중국 제조 공장에서 가져와 직접 개조하고 소프트웨어까지 만든 파눅(Fanuc)의 모습.
3D 프린팅이 디자이너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절삭 가공으로 불가능한 내부 깊숙한 곳까지 디자인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3D 모델링으로 표현되는 것이라면, 아무리 복잡하고 형태가 비현실적일지라도 말 그대로 똑같이 만들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필요한 만큼 층층이 쌓는 터라 재료의 낭비가 없어 돈도 굳고 환경에도 좋다는 점이다. 반대로 디자이너가 3D 프린터를 사용하기 주저하는 이유는 한 층 한 층 쌓아 올린 레이어의 흔적이 혹여 작업물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는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 그런 의미에서 네덜란드에서 요즘 가장 주목받는 영 디자이너, 디르크 판 데르 코이(Dirk van der Kooij)는 3D 프린팅의 장점만 쏙쏙 골라내 활용하는 영리한 인물이다. 심지어 단점을 역이용해 자신의 아이덴티티로 만들 정도다. 사실 3D 프린팅 하면 플라스틱 필라멘트를 녹여 쌓거나, 빛이나 레이저를 이용한 소결 방식 등 첨단 기술의 집합체 같지만, 그 근본적인 원리는 간단하다. 깎기보다 쌓아서 입체물을 만드는 것. 디르크 판 데르 코이에겐 스트라타시스나 3D 시스템스, 혹은 메이커봇 인더스트리의 말쑥한 프린터 대신, 거대한 팔이 달린 기계 친구 ‘파눅(Fanuc)’이 있다. 중국의 제조 공장에서 사용하던 로봇 팔을 가져와 개조한 뒤, 테이블이나 의자 등 커다란 크기의 작업물도 만들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까지 직접 개발했다. 게다가 재료 준비는 버려진 냉장고나 CD 케이스 등의 폐기물을 빻아 작업실로 가져오는 것으로 끝난다니 또 한 번 돈도 굳고 환경에도 좋은 일석이조다. 파눅에게 폐기물 가루를 먹이면, 그것을 고열로 깔끔하게 소화시키고 팔 끝에 달린 튜브에서 꾸덕한 반죽을 한 줄씩 짜내면서 디르크 판 데르 코이가 디자인한 대로 쌓아간다. 나아가 색을 첨가할 때 농도와 순서, 종류에 따라 무한대의 결과물이 탄생하니, 사람 손 한 번 닿지 않았는데 세상에서 하나뿐인 물건이 탄생한다. 이런 상황에서 한 줄씩 쌓인 티가 확 나는 텍스처는 숨겨야 하는 결점이 아니라 도리어 개성을 돋보이게 하는 매력으로 변한다. 덧붙여 현장 사진까지 360도로 찍어두는 노련함까지 보이니 어시스턴트도 필요 없다. 전기와 재료, 디자인만 있다면 알아서 혼자 척척 해내는 일당백인 셈.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기계에 요구한 것은 한 치의 오차도 없는 균질함과 사람이 할 수 없는 속도와 인내로 쉼없이 일하는 노동력이었다. 그런 덕목이 필요치 않은 파눅은 어쩌면 단순한 기계라기보다, 새로운 범주의 21세기 디지털 공예가로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렇다면 디르크 판 데르 코이는? 일단 지금은 수석 아트 디렉터라고 해두자. 앞으로 또 무슨 명칭을 얻게 될지 모르니까 말이다. www.dirkvanderkooij.nl 글: 전종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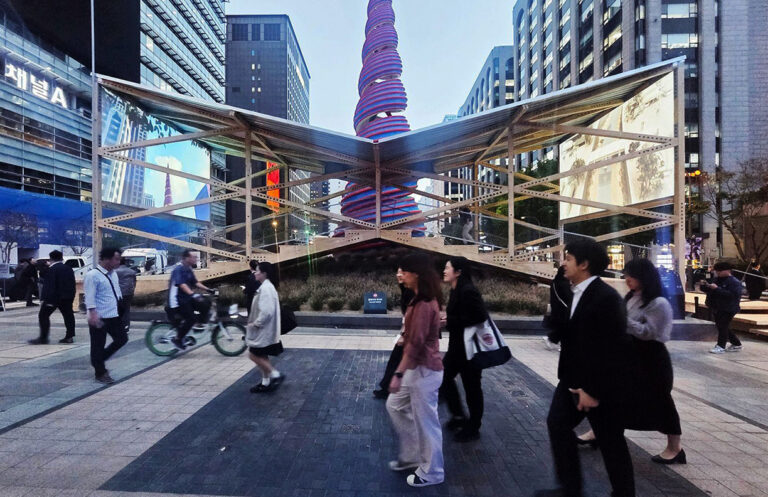

![[참가 모집] DBEW Award 2026, 국제 디자인 어워드 7 [참가 모집] DBEW Award 2026, 국제 디자인 어워드](https://design.co.kr/wp-content/uploads/2026/01/20260127_061323-768x1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