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완
구글 플레이 엔터테인먼트 UX 디자인 총괄
“디자인은 산업과 기술, 소비자를 모두 포괄하는 교집합입니다. 이제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잘하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돼요. 소비자 행동과 시대의 흐름을 읽고 디자이너에게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디자이너를 리드하는 디자이너로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죠.”


영어는 “How are you?”밖에 할 줄 몰랐던 안태완은 의지와 추진력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대학 재학 중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갔어요. 경마장이나 호텔 청소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화장품 공장에서도 일했어요. 영어 학원 다닐 돈이 별로 없었는데, 호텔 청소를 하면서 그들이 하는 말을 통째로 외웠더니 3개월쯤 되자 대화할 수준이 되더라고요.”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불과 3~4개월 만에 토플 시험을 본 후 그래픽 디자인으로 유명한 필라델피아 예술종합대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한 학기가 지나고 교수님을 찾아가 ‘여기서 제일 유명한 디자인 회사 3개만 알려달라’고 했고 배낭에 포트폴리오를 가득 넣고 유명 디자인 회사가 모여 있는 거리로 나가 20군데 이상 회사에 포트폴리오를 돌렸다. 가장 유명한 디자인 회사에는 계속 전화를 했다. 미국인도 인턴십을 구하기 힘들었던 시절,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과 MTV 모션 그래픽 파트에서 동시에 인턴십을 하기도 했다. 졸업 후에는 브랜딩 회사 시겔 & 게일에 입사했다. 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바로 일주일 뒤였다. 이 거침없는 이력에 대해 그는 “식상한 말일 수도 있지만 남들보다 미리, 많이 준비하고 다르게 준비했어요”라고 했다. 포트폴리오는 비주얼로 승부했다. 시각화된 포트폴리오가 유창하지도 않은 영어 문장을 달달 외우는 면접 준비보다 때로는 더 효과적이라는 것. 면접에서는 제출한 포트폴리오와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가지고 들어가 관심을 끌었다. “방학이 시작되면 이미 늦어요. 적어도 방학 한 달 반 전부터 포트폴리오를 보내야 해요. 일요일 새벽에 보내면 월요일에 담당자가 제 메일을 먼저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는 시겔 & 게일, 휴즈(Huge) 등에서 SAP나 HP 등의 브랜딩 디자인 프로젝트를 맡았다. 거기서 일하면서 동시에 3D와 영상 작업 등 필요한 기술을 새로 배웠다. “브랜딩과 웹 에이전시는 포토샵도 접근법이 완전 달랐어요. 휴즈에 시니어로 들어갔는데 이미 날고 기는 웹 디자이너가 많았어요.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매일 밤 혼자 웹 공부와 웹 디자인을 위한 포토샵을 공부했죠. 모르는 건 후배한데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의 경쟁력은 회사가 나를 계속 찾을 수 있게끔 스스로 툴을 익히고 할 수 있는 영역을 늘려간 데에 있었다. 나중에 보니 모션 그래픽과 디지털도 다루고 3D 모델링도 아는 사람은 그밖에 없었다. 이런 그에게 여러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고 몸담고 있던 회사는 그를 파격적인 조건으로 붙잡으려고 했다.
2015년 구글에 입사한 그는 구글 플레이 리브랜딩, 구글 플레이 북스 프로덕트 리디자인을 거쳐 현재는 구글 플레이(음악, 영화, TV, 책, 엔터테인먼트 뉴스)를 통해 디지털 콘텐츠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일을 맡고 있다. 이 콘텐츠의 핵심은 디지털로 보다 개인적이면서도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구글의 모든 연구, 개발 과정에는 프로덕트 매니저와 엔지니어, UX 디자이너를 한 팀으로 구성하는 크로스펑셔널(Cross Functional, XFN) 개념이 자리한다. 현재 미국의 많은 IT업계가 도입한, UX 디자인의 역할을 정의하는 한 축이다. “사실 그동안 통합적 팀을 구성하는 시도는 많았지만 여전히 디자이너는 서포터 입장이었죠. 크로스펑셔널 측면에서는 UX 디자인과 PM, 엔지니어링이 모두 디자인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마치 3개의 다리가 갖춰져야 서는 의자 같은 것이죠.”

안태완은 앞으로 비주얼, 인터랙션, GUI 디자인 등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동시에 넓어질 것으로 본다. 실리콘밸리의 많은 스타트업 기업이 사업을 시작할 때 디자이너와 함께 하는 데에서 알 수 있듯 특히 디자인은 핵심 파트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디자인은 비주얼화된 수학이라고 생각해요. 메시지 전달이 정확하고 또 목적에 부합하는 디자인을 추구해야죠. 구글 홈페이지가 검색에 최적화된 심플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도 그 이유죠.” 안태완은 다른 디자이너의 작품을 보고 영감을 얻곤 했던 이전과 달리 이제는 다른 사용자 테스트 결과를 보며 영감을 얻는다. “스티브 잡스가 ‘디자인은 어떻게 느끼느냐(How to feel)가 아니라 어떻게 작용하는가(How to work)이다’라고 말한 건 이제 디자인이 감성이 아닌 논리 싸움이 되었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특히 매니저 이상이 되면 설득과 커뮤니케이션이 더 중요해지죠.”
하지만 그는 오히려 언어 문제는 미약한 부분이고 자신이 가진 강점을 부각시키는 편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사치 & 사치 재직 시절 그는 상사에게 ‘동양인은 왜 리더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보통 우리는 문화나 인종의 벽으로 리더 자리에 오르기 힘들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기회가 있음에도 도전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디자인은 산업과 기술, 소비자를 모두 포괄하는 교집합입니다. 이제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잘하는 것에만 집중해서는 안돼요. 소비자 행동과 시대의 흐름을 읽고 디자이너에게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디자이너를 리드하는 디자이너로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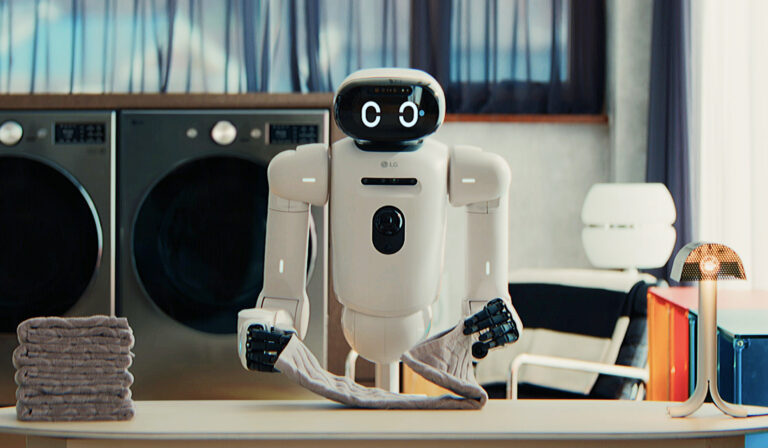
![[얼리버드 티켓] 실리콘밸리 빅테크의 K-디자이너들 15 [얼리버드 티켓] 실리콘밸리 빅테크의 K-디자이너들](https://design.co.kr/wp-content/uploads/2026/01/20260113_032450-768x38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