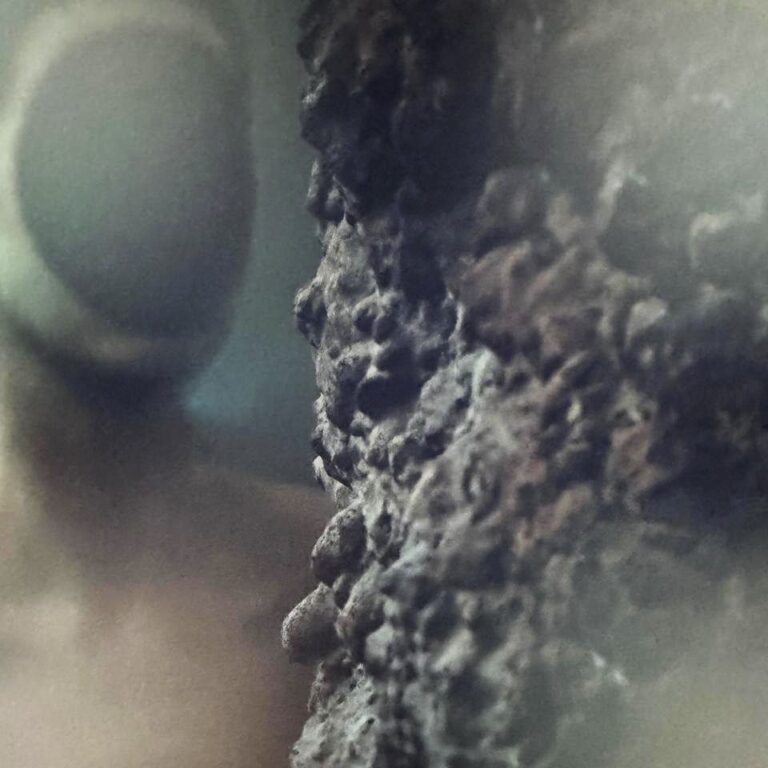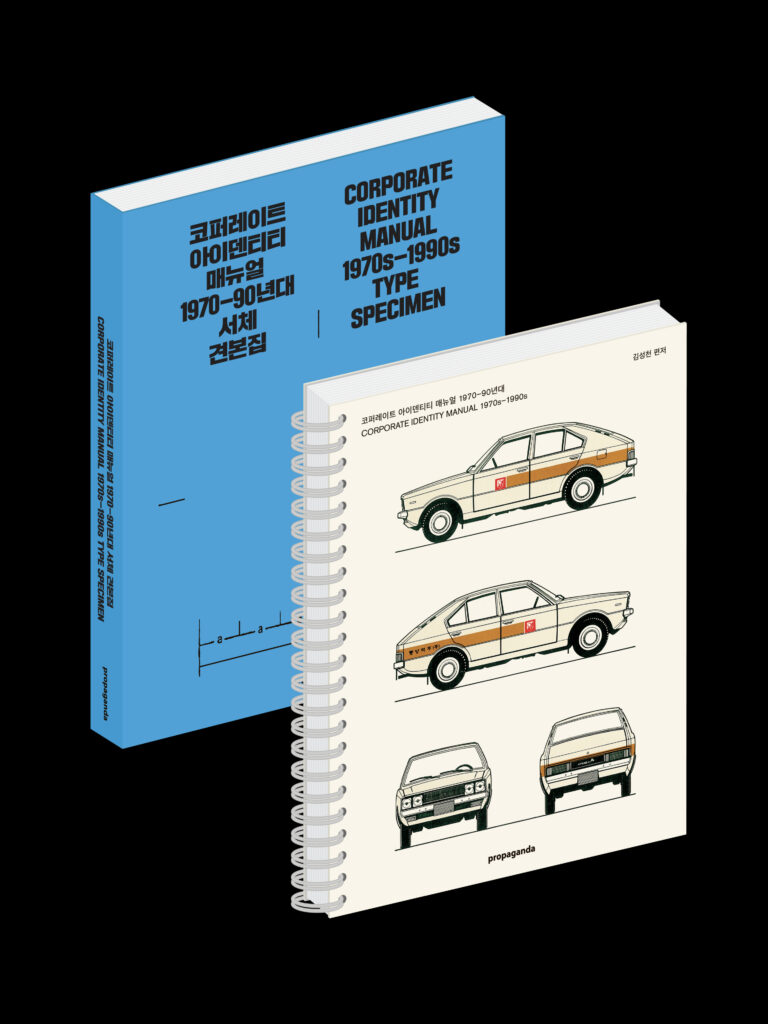[2025 월간 〈디자인〉이 주목하는 디자이너 15팀] 멜트미러
<Whiplash>부터 <Kyo181>까지. 동시대 음악 신에서 짙게 묻어나는 이 날 선 '쇠맛'은 멜트미러의 손에서 나온다.

![[2025 월간 〈디자인〉이 주목하는 디자이너 15팀] 멜트미러 1 20250106 100922](https://design.co.kr/wp-content/uploads/2025/01/20250106_100922-832x1247.jpg)
국내 음악 신에 ‘쇠맛’이라는 생전 처음 보는 단어가 등장했다. 혀끝에 금속을 가져다 댄 것처럼 자극적이고 강렬한 음악 스타일을 빗댄 표현이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이른바 ‘쇠맛 아티스트’로 이름을 알린 실리카겔과 에스파 모두 뮤직비디오 덕을 톡톡히 봤다. 〈Whiplash〉 〈Kyo181〉 등 유수의 뮤직비디오에서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이 날 선 감각은 바로 멜트미러의 것이다. 그의 작품 세계 전반에 녹아 있는 금속 미학은 특유의 서늘한 색감과 직관적인 컷 편집 방식에서 비롯한다. “창작자로서 나의 태도와 결과물 모두 단호한 면이 있다. 그 단호함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고심 끝에 에스파 뮤직비디오 작업을 수락하면서 세운 다짐 역시 스스로의 감각과 관점이 묻어나는 작품을 선보이겠다는 것이었다. 레퍼런스에 기대는 대신 철저한 리허설을 토대로 머릿속 이미지를 구현하는 데에 몰두한 건 바로 그 때문이다. 기존의 뮤직비디오 촬영 관행에서 벗어난 탓에 우려의 말이 오갔지만, 창작자의 작업 스타일을 존중해주는 클라이언트와 프로덕션을 만난 덕에 원하는 바를 실현할 수 있었다. 아티스트를 근사하게 보여주는 데에 초점을 맞추는 여느 뮤직비디오와 달리, 멜트미러의 세계에서는 인물마저도 특정한 운동감을 지닌 객체에 불과하다. “영상이 전하는 메시지는 궁극적으로는 이미지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설명하기 시작하는 순간 프로파간다가 된다. 좋은 이미지를 엮어놓는 것만으로도 전하고자 하는 내용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2025 월간 〈디자인〉이 주목하는 디자이너 15팀] 멜트미러 2 HWI 1](https://design.co.kr/wp-content/uploads/2025/01/HWI_1-832x468.jpg)
![[2025 월간 〈디자인〉이 주목하는 디자이너 15팀] 멜트미러 3 HWI 4](https://design.co.kr/wp-content/uploads/2025/01/HWI_4-832x468.jpg)
![[2025 월간 〈디자인〉이 주목하는 디자이너 15팀] 멜트미러 4 WHIP 04](https://design.co.kr/wp-content/uploads/2025/01/WHIP_04-832x468.jpg)
이와 같은 작업 태도를 본격적으로 투영하기 시작한 건 실리카겔의 〈No Pain〉 뮤직비디오부터였다. 작품의 스토리라인을 보일 듯 말 듯 전개하기 위해 멜트미러가 즐겨 사용하는 도구는 바로 선입견이다. 특정 장르와 이미지에 대한 관객의 선입견을 미묘하게 건드리면서 내용적 긴장감은 유지하되 시각적 완결성을 해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어느덧 대중은 잘개 쪼갠 컷과 특유의 카메라 무빙만 보고도 그의 작업을 알아보기에 이르렀다. 혹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멜트미러의 뮤직비디오에는 지문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2025 월간 〈디자인〉이 주목하는 디자이너 15팀] 멜트미러 5 Kyo181 2](https://design.co.kr/wp-content/uploads/2025/01/Kyo181_2.jpg)
![[2025 월간 〈디자인〉이 주목하는 디자이너 15팀] 멜트미러 6 Kyo181 6](https://design.co.kr/wp-content/uploads/2025/01/Kyo181_6-832x623.jpg)
그러나 멜트미러를 뮤직비디오 감독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를 절반만 이해하는 것이다. 그는 요새 부업으로 뮤직비디오를 만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다닌다. 돌이켜보면 멜트미러는 언제나 생각의 속도에 부합하는 매체를 따라 흘러왔다. 대학 시절 전공한 동양화가 생각의 템포를 따라오지 못하자 영상이라는 대안을 찾아냈고, 불현듯 뮤직비디오 감독으로서 은퇴를 선언하고 2년간 홀연히 사라졌던 것도 생각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좇을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지금 시점에서 멜트미러의 본업은 게임 개발자다. 2018년 동료 창작자들과 함께 ‘isvn’이라는 게임 제작 공동체를 결성한 것이 그가 게임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된 시발점이 되었다. isvn의 첫 프로젝트는 TRPG 게임 ‘데저트 이글: 교차-공간 회의’였다. 실리카겔이 발매한 동명의 앨범 속 세계관을 게임으로 치환한 것으로, 음악에 담긴 이야기를 새로운 방식으로 즐기도록 유도하는 작업이었다. 처음에는 게임의 시각적 요소를 차용한 영상을 만들다가 점차 게임의 매체적 속성 자체에 매료되어 개발에까지 뛰어들게 됐다. 가까운 목표는 2023년부터 이어온 ‘P.O.G frame’ 프로젝트를 온전한 게임 형태로 완성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술관 화이트 큐브 안에서 다소 제한된 형식의 게임을 선보일 수밖에 없었다면, 앞으로는 그만의 게임 언어를 구축하는 데에 집중할 계획이다. 마흔이 되기 전에 디지털 게임 하나를 온전히 완성하는 게 목표라고.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재능 하나를 충분히 발전시켜놨으니, 이제는 잘하는 일보다 욕심나는 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잘하는 일도, 하고 싶은 일도 허투루 하지 않는 멜트미러의 타협 없는 행보를 응원한다.
![[2025 월간 〈디자인〉이 주목하는 디자이너 15팀] 멜트미러 7 POG 5](https://design.co.kr/wp-content/uploads/2025/01/POG_5-832x1064.jpg)
![[2025 월간 〈디자인〉이 주목하는 디자이너 15팀] 멜트미러 8 POG 7](https://design.co.kr/wp-content/uploads/2025/01/POG_7-832x1064.jpg)


![[위클리 디자인] 선물하기 좋은 감각적인 F&B 브랜드들 11 [위클리 디자인] 선물하기 좋은 감각적인 F&B 브랜드들](https://design.co.kr/wp-content/uploads/2026/02/20260208_175221-768x768.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