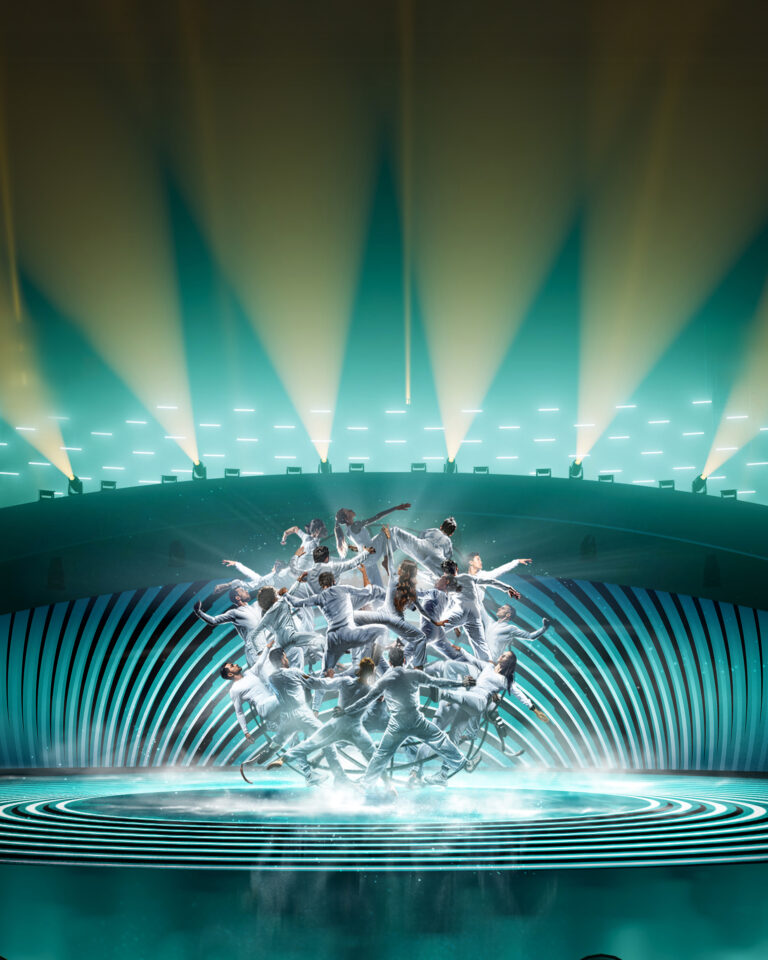로테르담이 건축을 대표하는 도시가 된 사연
파괴와 재생 사이에서 태어난 건축 도시
로테르담은 1940년 폭격으로 폐허가 된 뒤, 과거의 복원이 아닌 미래를 실험하는 도시로 거듭났다. 전후 기능주의 건축부터 공동체 중심의 전환, 렘 콜하스와 MVRDV의 실험적 작품까지, 도시 전체가 ‘변화하는 건축의 실험실’로 진화했다.


백조의 곡선을 연상시키는 에라스무스 다리(Erasmus Bridge)가 강 위로 뻗어오를 때, 그 뒤로 솟아오른 건물들은 도시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이야기한다. 데 로테르담(De Rotterdam)의 묵직한 몸체는 수직으로 쌓아 올린 도시의 비전처럼 보이고, 디포 보이만스 판 보이닝언(Depot Boijmans Van Beuningen)의 거울 파사드는 하늘과 땅, 나무와 사람을 건물 속으로 빨아들여 풍경 자체를 전시한다. 천장 가득 과일과 꽃의 환영이 떠다니는 마르크트할(Markthal)에 들어서면 장터의 소란스러움이 마치 미술관 설치 작업을 연상시킨다.

로테르담은 단순한 항구 도시가 아니라, 건축이 도시의 언어가 되고 서사가 되는 드문 장소다. 하지만 이런 건축 도시의 면모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20세기 초 화려했던 항만 도시는 1940년 5월 독일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됐고, 도심의 대부분이 잿더미로 변했다. 다른 유럽 도시들이 잃어버린 과거를 복원하는 이른바 땜질식 복원에 힘쓸 때, 로테르담은 과거의 재현 대신 미래의 실험을 선택했다. 이 결단이야말로 로테르담을 건축의 도시로 만든 첫 번째 전환점이었다.
청사진이 된 기능주의 도시계획

국제현대건축회의(CIAM)의 기능주의 도시계획은 전후 로테르담의 청사진이 됐다. 도시를 주거, 노동, 교통, 여가라는 네 가지 기능으로 구분하고, 합리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 원칙은 휴익 마스칸트(Huig Maaskant)가 설계한 그루트 한델스헤보우(Groot Handelsgebouw)에 뚜렷이 드러난다. 1953년 중앙역 앞에 완공된 이 거대한 직육면체 건물은 사무실과 상점, 창고, 식당을 품은 복합체로, ‘도시 속의 도시’라 불렸다. 시민들에게 이 건물은 단순한 업무 공간이 아니라 전쟁의 잿더미 위에 세워진 부활의 건축이었다.

같은 해, 요 판 덴 브룩(Jo van den Broek)와 야프 바케마(Jaap Bakema)가 설계한 라인반 쇼핑거리(Lijnbaan)는 유럽 최초의 보행자 전용 거리로 탄생했다. 자동차 대신 걷는 사람들의 흐름이 도시의 중심이 됐고, 유리와 콘크리트로 지어진 상점들은 소비와 유통이 새로운 방식으로 조직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전후 시민들에게 라인반은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미래의 거리를 미리 체험하게 해주는 무대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기능만을 강조한 도시는 인간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건축가들은 기계적 합리주의가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를 위한 건축을 원했고,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팀 10(Team 10)이 탄생했다. ‘도시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 관계의 패턴’이라는 선언 아래, 야프 바케마와 알도 반 아이크(Aldo van Eyck)는 인간적 규모와 사회적 맥락을 도시 계획 속에 다시 불러들였다. 이 시기의 건축은 놀이, 만남, 이웃 관계를 염두에 뒀고, 피에트 블롬(Piet Blom)의 큐브 하우스(Cube Houses)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1984년 블라크(Blaak) 지구에 세워진 이 집합 주택은 45도 기울어진 정육면체를 기둥 위에 얹어 숲처럼 배열했다. 거주자에게는 불편하다는 평도 있었지만, 큐브 하우스는 주거를 조형 실험으로 바꾸며 사는 방식 자체를 묻는 건축으로 남았다.



이 시기에 건축사에 빠지지 않는 장소가 있다. 소네벨트 하우스(Sonneveld Huis)다. ‘니우베 바우언(Nieuwe Bouwen, 신건축)’ 양식으로 가장 잘 보존된 건물 가운데 하나로, 1933년 레인 판 데르 플뤼흐트(Leen van der Vlugt)가 소네벨트 가족을 위해 설계한, 당시로서는 초현대식 주택이다. 네덜란드 기능주의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며, 다양한 디테일이 집 안 곳곳에 숨어 있다. 책장, 옷장, 오디오 시스템을 겸하는 내장형 소파, 10개의 노즐을 갖춘 분사 샤워실, 집 안에 설치된 12대의 전화기가 그것이다. 1930년대에 이런 주거 환경은 혁신 그 자체였으며, 네덜란드 근대 건축이 얼마나 과감하게 미래를 상상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도시 전체를 건축 안에 담아내다




로테르담은 이처럼 1930년대의 선구적 실험부터 전후 기능주의와 공동체적 전환, 그리고 생활 방식의 실험적 건축까지 이어지며 도시 자체를 갱신해왔다. 이러한 연속선 위에서 1980년대 이후 로테르담은 다시 세계 건축 담론의 중심으로 부상했다. 그 중심에는 렘 콜하스(Rem Koolhaas)와 그의 사무소 오엠에이(OMA, Office for Metropolitan Architecture)가 있었다. 콜하스는 도시를 정치, 경제, 문화의 복합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며 건축을 도시 자체의 압축판으로 제시했다. 1992년에 완공된 쿤스트할(Kunsthal)은 고정되지 않은 전시 공간을 통해 프로그램이 건축을 바꾼다는 철학을 구현했고, 2013년의 데 로테르담은 주거, 사무, 호텔, 상업시설을 수직으로 쌓아 올린 44층의 초거대 복합 건물로, 각기 다른 블록이 미묘하게 어긋난 군집을 이루며 보는 위치에 따라 다른 풍경을 만들어낸다. 이는 도시 전체를 건축 안에 응축해 놓은 것 같은 압도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오늘날 로테르담은 지속가능성과 실험이 교차하는 무대가 되었다. 엠브이알디브이(MVRDV)는 그 중심에서 도시를 재해석하고 있다. 2014년 완공된 마르크트할은 장터와 주거, 주차를 결합한 말굽 모양의 아치 건물로, 내부 천장에 펼쳐진 11,000㎡의 벽화 ‘풍요의 뿔(Horn of Plenty)’이 일상을 축제처럼 만든다. 시민들은 음식을 주문하고, 장을 보다가 고개를 들어 거대한 과일과 꽃, 나비가 하늘처럼 떠 있는 광경을 마주하며 마치 미술관에 온 듯한 체험을 경험한다.


2021년 개관한 디포 보이만스 판 보이닝언은 세계 최초로 미술관 수장고를 전면 공개한 사례다. 하늘과 도시를 비추는 타원형 거울 건물 속에서 관람객은 15만 점의 작품이 보존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할 수 있다. 미술관의 뒷무대를 전면에 드러낸 이 건축은 투명성과 공유의 새로운 모델이 된다.


이밖에도 로테르담은 기후 위기에 맞서는 다양한 실험을 이어간다. 옛 철도 고가를 녹지로 바꾼 호프보헨파크(Hofbogen Park)는 여름에는 시원한 미기후를 조성하고 도심 생물 다양성을 높이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산책로를 제공한다. 강 위에는 떠다니는 플로팅 오피스(Floating Office Rotterdam)가 들어서 있어, 건축이 기후 변화 시대에도 물 위에 적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외에 목조 고층 건물 사와(SAWA)는 네덜란드에서 가장 건강한 건물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대형 녹색 테라스와 공용 옥상 정원을 품을 예정이다.

로테르담은 시대의 불확실성 속에서 건축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시험해볼 수 있는 장이다. 건축은 한 번 세워지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급격히 변하기도 어렵지만, 그 속에 담기는 삶의 조건과 도시의 맥락, 미래의 풍경은 끊임없이 달라진다. 그렇기에 건축과 도시, 그리고 그것을 구성하는 터전과 삶의 이야기는 완결된 해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과정이다.
도시를 지켜본다는 것은 특정한 시대가 무엇을 우선시하고 무엇을 희생하는지를 읽어내는 일이자, 산업과 사회가 어떤 가치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일이다. 로테르담의 건축들은 완성된 모델이 아니라 불확실한 질문에 대한 임시적인 응답으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는 주목할 만하다. 그리고 로테르담의 진행 중인 실험을 지켜보는 일 역시 우리 시대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읽는 나침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