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가구계의 타고난 디자인 감별사, 파트리치아 모로소
1980년대 중반 가족 회사인 모로소에 합류한 뒤 오빠 로베르토 모로소(Roberto Moroso)와 가구에 오트 쿠튀르적 성향의 디자인을 덧입히는 시도로 존폐 위기에 놓여 있던 모로소를 세계적인 가구 브랜드로 탈바꿈시켰다.


모로소의 아트 디렉터.
1980년대 중반 가족 회사인 모로소에 합류한 뒤 오빠 로베르토 모로소(Roberto Moroso)와 가구에 오트 쿠튀르적 성향의 디자인을 덧입히는 시도로 존폐 위기에 놓여 있던 모로소를 세계적인 가구 브랜드로 탈바꿈시켰다. 탁월한 안목과 스카우트 능력으로 마시모 로사 기니, 론 아라드, 알프레도 하베를리(Alfredo Haberli), 기타 도시유키, 톰 딕슨(Tom Dixon), 론트(Front) 등과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모로소와의 협업을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끈끈한 유대 관계를 기반으로 한 크리에이티브가 오늘날의 모로소를 만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인 1952년에 설립한 모로소(Moroso). 초기에는 주로 미국 스타일의 소파와 의자를 제조하는 평범한 가구 회사에 불과했지만 1980년대에 들어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했다. 론 아라드(Ron Arad), 로스 러브그로브(Ross Lovegrove), 마르셀 반더스(Marcel Wanders), 넨도(Nendo) 등 수많은 스타 디자이너와 협업을 진행하며 명실상부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가구 브랜드 중 하나로 자리잡은 것. 현재 모로소는 전 세계 64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뉴욕 모마(MoMA)와 파리 팔레 드 도쿄(Palais de Tokyo)등 유명 미술관과 행사에 전시 초대를 받기도 한다. 이런 성공의 중심에는 아트 디렉터 파트리치아 모로소(Patrizia Moroso)가 있었다. 30여 년간 모로소를 지키며 브랜드를 성장시킨 그녀가 지난 10월 신사동 도산공원 근처에 새롭게 오픈한 모로소 플래그십 스토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아시아 최초의 플래그십 스토어이기 때문일까, 파트리치아 모로소는 인터뷰 내내 흥분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글: 최명환 기자, 인물 사진: 김정한(예 스튜디오)

1980년대 중반부터 모로소의 아트 디렉터로 활동해왔다. 가족 회사에서 아트디렉터로 일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나?
원래 나는 대학에서 아트 & 커뮤니케이션을 공부했다. 예술 전공 학생으로서 당연히 졸업 후 아티스트가 되거나 갤러리에서 일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1980년대 경제 위기가 닥치며 상황이 변했다. 모든 산업에서 정체기가 시작됐는데 모로소도 예외가 아니었다. 회사가 경영난을 겪자 부모님이 사업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뜻을 비치셨다. 제안을 받고 나서 패밀리 비즈니스에 참여해 가업을 이어가는 길이 나의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 부모님은 우리 남매가 가업을 잇지 않겠다고 하면 회사를 폐업할 생각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맡진 않았을 것 같다.
물론이다. 처음에는 그래픽 디자이너의 일을 돕는다거나 포토그래퍼의 화보 촬영을 돕는 등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당시 예술을 전공하던 친구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가 바로 훗날 멤피스(Memphis)의 멤버가 된 마시모 로사 기니(Massimo Iosa Ghini)다. 지금은 명성 있는 건축가이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그저 열정 넘치는 20대 학생에 불과했다(웃음). 그와 함께 1987년에 발표한 다이내믹(Dinamic) 컬렉션이 업계의 주목을 받으며 세계적인 브랜드로 성장할 기회를 얻었다. 당시 다이내믹 컬렉션은 20대 특유의 신선하고 아방가르드한 감성이 잘 녹아 있었고 이 컬렉션을 기점으로 많은 디자이너, 예술가와 협업할 기회를 얻었다.


(좌) 마크 테이블(Mark Table),
모로소라는 브랜드 안에서 성장한 만큼 누구보다 브랜드의 철학과 분위기를 잘 이해할 것 같다. 당신이 생각하는 모로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어린 시절 모로소 테이블 아래나 소파 뒤에 숨어 숨바꼭질을 하며 자랐다. 따라서 유년 시절 모로소에 대한 나의 기억은 ‘행복’이다. 모로소의 가장 큰 특징은 관계가 아닐까 싶다. 부모님이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아버지는 20살, 어머니는 16살에 불과했다. 아주 젊은 시절에 시작한 사업인 만큼 주변 친구나 가족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나 역시 젊은 시절부터 아트 디렉터로 활동하며 마시모 로사 기니나 론 아라드 같은 크리에이터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우리는 비즈니스 파트너이기 이전에 둘도 없는 친구 사이다. 우리는 무척 젊었고 열정과 도전 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 결국 끈끈한 유대 관계를 기반으로 한 크리에이티브가 오늘날의 모로소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디자이너와 협업할 때 좋은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당신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나는 협업의 진정한 의미에 많은 공을 들이며 일을 추진한다. 앞서 말했듯 모로소는 관계를 중시하는 브랜드다. 따라서 디자이너의 의견과 모로소의 의견을 잘 조율하고 수렴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협업이라는 여행의 종착지에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모로소의 협업은 비단 상업성을 띤 제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개성 있고 아방가르드한 디자인 프로젝트도 다수 진행하는데 이 역시 관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다시 말해 창의적인 작업에 목마른 디자이너들이 모로소와의 협업을 통해 이런 갈증을 해소한다고 보면 된다.

당신은 단순히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하는 것뿐 아니라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안목도 탁월하다. 본격적으로 유명해지기 전에 재능을 알아보고 협업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달라.
토드 분체(Todd Boontje), 니파 도시(Nipa Doshi) & 조나단 레비앵(Jonathan Levien) 등이 대표적이다. 파트리시아 우르퀴올라(Patricia Urquiola)도 빼놓을 수 없다. 파트리시아의 경우 어느 스튜디오의 어시스턴트로 근무하던 시절 그녀의 디자인에서 흥미로운 단면을 발견하고 협업을 제안했다. 지금까지 모로소의 꽤 많은 프로젝트가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시작됐다. 프로젝트를 위해 디자이너를 찾아다니는 편은 아니다. 대신 재미있고 흥미로운 작품을 만났을 때 그 작품을 만든 크리에이터를 찾아가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레 협업이 이뤄진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토비아스 레베르거(Tobias Rehberger), 마이클 린(Michael Lin), 안드레아 살라(Andrea Sala) 등 순수 아티스트와 협업하기도 했다.
사실 순수 예술가와의 컬래버레이션은 모로소에 영감을 선사하는 부수적인 프로젝트다. 여전히 모로소를 이끄는 주 원동력은 디자이너와의 협업이라고 생각한다.
서울 플래그십은 모로소의 크리에이티브 팀이 직접 디자인하고 당신이 손수 쇼룸의 디자인과 스타일링을 최종 검토했다. 그만큼 이 매장이 모로소에 각별한 의미가 있다는 뜻인가?
그렇다. 모로소가 타 문화권에 플래그십 스토어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입 가구 회사 두오모를 통해 모로소 제품을 판매한 지 15년 만의 일이니 실로 긴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가 일반 매장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모로소 플래그십 스토어는 원래 패션 리테일 매장이었는데 솔직히 처음 공간을 봤을 땐 규모가 좀 작지 않나 생각했다. 하지만 쇼룸을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하자 오히려 한국의 주거 공간에 적합한 크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각 층을 각기 다른 콘셉트의 집이라 생각하고 공간을 바라보니 클래식한 집, 우아한 집, 창의적인 집 등으로 다르게 연출할 수 있겠더라. 특히 론 아라드의 돌로레즈(Do-Lo-Rez)를 중심으로 사방이 거울로 둘러싸인 공간을 둘러보길 권한다. 이번 쇼룸은 모로소의 뿌리인 이탈리아 하우스 스타일을 보여주는 공간이다. 이탈리아 스타일이 앞으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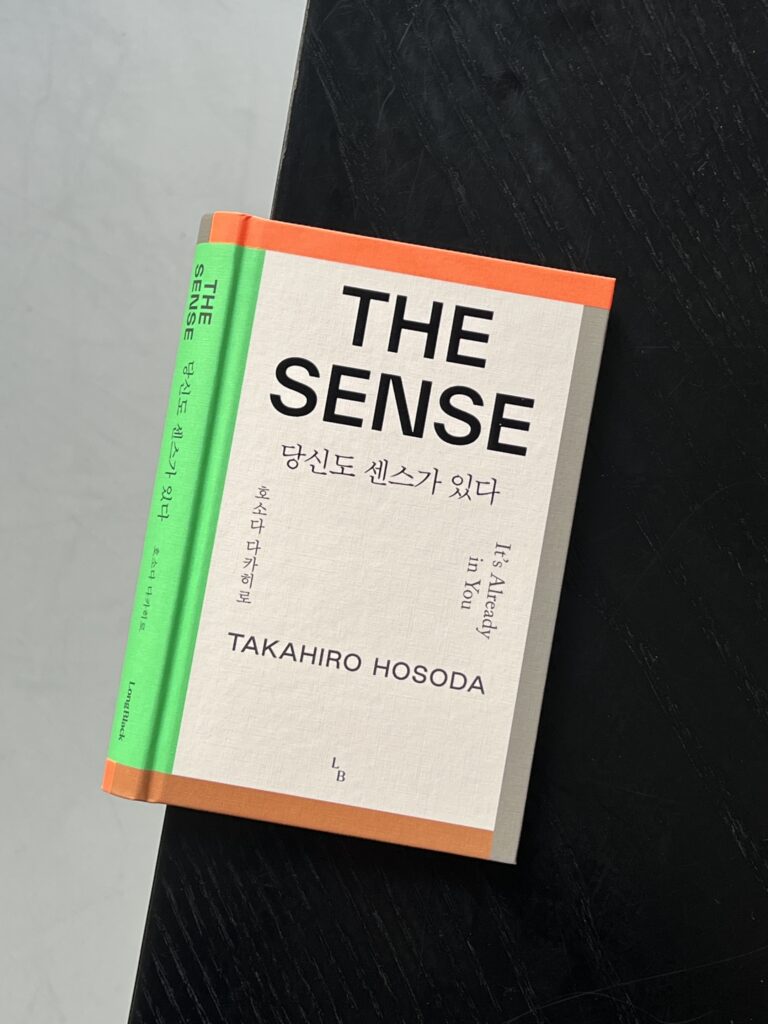

![[2026 월간 〈디자인〉이 주목하는 디자이너 15팀] 슈퍼포지션 12 [2026 월간 〈디자인〉이 주목하는 디자이너 15팀] 슈퍼포지션](https://design.co.kr/wp-content/uploads/2025/12/20251224_075607-768x106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