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을 벗어난 ‘한국적 인테리어’의 가능성
2024 아름지기 기획전 〈방(房), 스스로 그러한〉
옛 주거 공간이 지닌 요소들을 재해석해 현대 주거 공간을 위한 한국적 스타일의 인테리어로 제안하는 〈방(房), 스스로 그러한〉전이 11월 15일까지 아름지기 통의동사옥에서 열린다.


무엇이 한국적 인테리어일까? 한국적인 것들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으나 실내 공간이 그 주인공이 된 적은 없다. 대체로 우리는 전통 가옥인 한옥의 특징을 강조해 표현한 것을 한국적인 스타일이라고 여겨왔다. 지금 아름지기 통의동사옥에서 열리는 〈방(房), 스스로 그러한〉전은 한국적 인테리어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둔 전시이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재료가 지닌 고유한 물성을 존중하는 미감, 우리의 옛 주거 공간이 지닌 구조·형태적, 개념·정서적 요소를 재해석해 현대 주거 공간을 위한 한국적 인테리어로 새롭게 제안한다.
왜 방일까?

우리 것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재단법인 아름지기는 해마다 의식주(衣食住) 중 하나의 테마를 선정해 전통 장인 및 현대 작가, 디자이너와 함께하는 기획전을 진행한다. 〈방(房), 스스로 그러한〉은 아름지기에서 선보이는 여덟 번째 주(住) 전시이다. 전통 가구와 목공예, 건축의 기본 토대인 바닥, 공간을 구분하고 통로가 되는 문, 비를 막고 그늘을 만드는 지붕을 탐구한 이전 주(住) 전시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되었다. 부분 요소들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최소의 공간인 ‘방’을 자연스럽게 탐구하게 된 것이다. 이번 전시는 크게 방이라는 공간 디자인과 그 방을 채운 가구 디자인, 두 부문에서 한국 주거 공간을 새롭게 모색했으며, 김민재·김찬혁·박지원·최원서, 스튜디오 히치, 임태희디자인스튜디오 등 9팀이 참여했다.
아름지기 사옥에 펼쳐진 한국적 공간 디자인
전시가 진행되는 아름지기 통의동사옥 또한 전통의 실용적 기능에 대한 고민이 깃든 장소이다. 한옥과 마당을 2층에 배치함으로써 현대 건축물과 새롭게 관계 맺도록 했다. 이번 전시는 화이트 큐브의 전시장인 1층에서 시작된다.

1층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작품은 최윤성 아름지기 아트디렉터가 완성한 알파룸 ‘Just As It Is’이다. 알파룸은 아파트 평면 설계상 남는 내부 자투리 공간으로, 획일화된 아파트 주거 디자인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는 공간. 최윤성 아름지기 아트디렉터는 한국적으로 해석한 알파룸을 통해 한국적 공간의 미와 지혜가 아파트에서 계승되도록 하는 실험적 시도로서 이 작품을 선보였다. 한옥의 시각적 요소보다 구조적이고 내면적 요소, 이를테면 들창을 통한 중첩성과 확장성, 빛과 마감재가 만들어내는 아늑함 등에 주목했다.

임태희디자인스튜디오의 임태희 디자이너는 한지로 집 ‘부드러운 은신처’를 만들었다. 한옥의 내부에서 벽과 천장, 창문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된 한지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재사용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전통 공간이 주는 아늑함이라는 정서를 부드럽고 유연한 한지로 구현한 것. 공간뿐만 아니라 도구에도 한지가 활용된 것처럼 차탁이나 지장, 병풍 같은 한지로 만든 소가구 또한 현대적인 미감으로 재해석해 완성했다. 색이 들어간 레진을 활용한 디딤석에서는 한지와 현대적 소재와의 어울림을 엿볼 수 있다.

온지음 집공방은 조선시대 이전의 방에서 한국적 공간 디자인을 탐구했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집은 하나의 큰 방이었고, 이는 여러 막으로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이 분리되었을 것이다. 2층에서 만날 수 있는 온지음 집공방의 ‘염막병장(簾幕屛帳)’은 각각 발, 막, 병풍, 휘장을 일컫는 한자어로, 이들은 공간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공간막이들이다. 온지음 집공방은 ‘염막병장’을 통해 공간막이가 공간을 형성하는 건축적 가능성과 공간막이의 현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국적 공간 디자인에 대한 제안은 3층으로 이어진다. 건축 디자인 스튜디오 히치의 박희찬 건축가는 흙과 대나무로 만드는 한국 전통의 목조심벽(일명 흙벽)이 현대 내부 공간에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3층 전시장에 설치된 ‘공간 감지 인스트러먼트’는 전통의 마감 공법을 연구해 숙련된 장인과 함께 만든 모듈화된 목조심벽 패널이다. ‘인스트러먼트(instrument)’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사용자가 직접 패널을 움직이며 공간을 변형할 수 있는 ‘무빙 월’로 제작되었다. 흙과 볏짚이 만들어낸 질감 등을 통해 시각, 후각, 촉각으로 자연을 경험하게 한다.
한국적 공간을 위한 가구


2층의 한옥과 마당에서는 한국적 공간을 위한 가구를 만날 수 있다.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김민재 작가는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에서 처음으로 작품을 선보였다. 그는 그동안 해온 가구 작업 중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던 한국적 요소에 집중했다. 방에 놓인 ‘목침이 있는 평상’이나 ‘문이 있는 흔들의자’가 기존 작업의 연장선에서 선보인 작품. 지붕 아래 사람이 있는 편안할 안(安) 자에서 형태를 딴 ‘지붕을 진 등’, ‘레진 병풍’은 작가가 전통적 방의 요소인 병풍과 보료를 자신의 언어로 재해석해 새롭게 선보인 작업이다.


김민재 작가와 함께 한옥 방 한 칸을 채운 최원서 작가는 산업 자재인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작업의 주 소재로 사용한다. 그는 알루미늄 프로파일의 단면 무늬와 한옥의 단청, 창살, 처마 등의 연결해 한옥이 갖고 있는 구조적 형태나 특징을 자신의 작업으로 치환했다. 보와 기둥이 연결된 직각 구조에 설치된 ‘기하보아지’나 ‘기하살-문’ 같은 작업이 그렇다. 특히 ‘기하살-문’은 미색의 기본 창호지가 아닌 채도 높은 컬러를 활용해 조금 더 색다른 감상을 준다.

김찬혁 작가는 우리의 좌식 생활에 맞는 대표적인 가구가 없다는 지점에서부터 아이디어를 전개했다. ‘Standard Floor’는 과거 좌식 생활이 아닌 현대의 좌식 생활 – 소파에 기대어 TV나 책을 보고 요기를 하는 – 을 위한 좌식 의자이다. 의자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장 프루베의 ‘Standard Chair’처럼 좌식 의자의 기본적인 형태를 제안한다. ‘Chim’은 소반에서 한발 더 나아간 새로운 한국적 테이블이다. 좌식 팔걸이로 사용되던 의침을 재해석한 것. 또한 팥색과 먹색을 활용해 현대 인테리어와도 잘 어우러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2층에 올라서자마자 보이는 박지원 작가의 ‘의자연’은 주변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태도를 통해 만들어진 한국적 미감에 주목한 작품이다. 그는 작품이 야외에 놓이는 특성상 주변 풍경 및 계절감과 어우러지는 색깔을 찾기 위한 테스트를 많이 진행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 거리의 가로수, 경복궁 돌담과 작품들이 근사하게 어우러진다. 박지원 작가는 유연한 형태를 만들기 위해 일부러 애쓰기보다 자신의 몸과 흙이 만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포착하며 작품을 완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의 형태에서도 한국적 미감을 발견할 수 있다.


온지음 디자인실의 이예슬 디자이너는 고구려 고분 벽화에 그려진 가구와 숙종실록에 적힌 “갑옷은 철갑보다 피(가죽)갑, 철보다 가벼운 가죽에 옻칠을 하면 화살촉과 총알이 뚫고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강력하다”와 같은 기록에서 영감을 받아 옻칠로 마감한 가죽 상판에 말발굽 형태의 다리를 둔 테이블 ‘삼발이’를 디자인했다. 2층의 마당과 한옥 툇마루에서 다양한 높이의 ‘삼발이’를 경험할 수 있다.

아름지기 신연균 이사장은 이번 전시에 대해 “한국의 고유한 정서와 미감을 담은 다양한 방을 통해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을 한층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환경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축가와 디자이너, 아티스트가 제안하는 공간과 작품을 경험하며 한국적 인테리어에 대한 생각을 확장하고, 현대 주거 공간과의 조화로운 접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방(房), 스스로 그러한〉전은 11월 15일까지 아름지기 통의동사옥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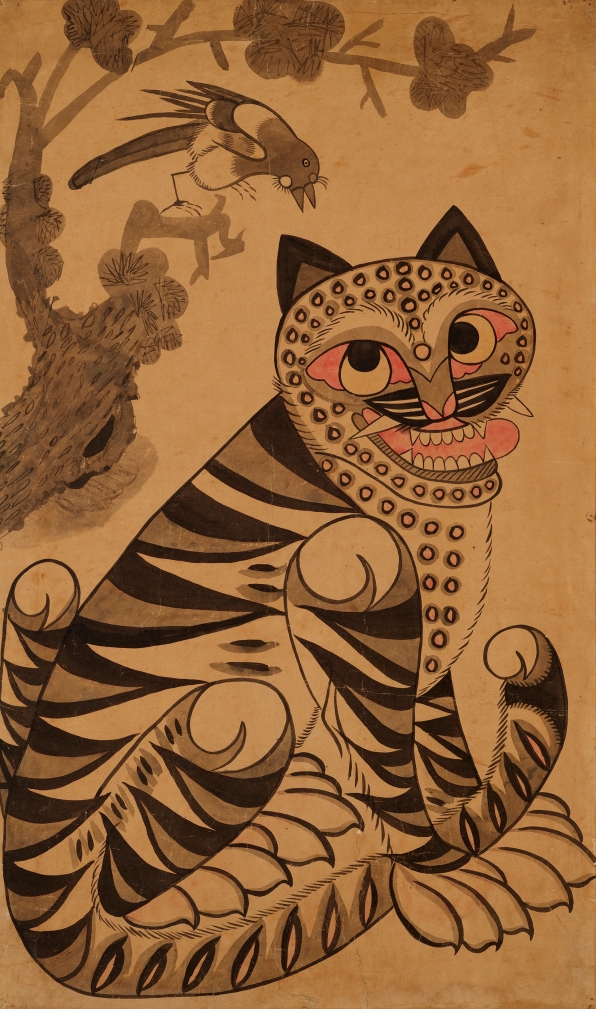


![[Creator+] 비주얼 아티스트 연여인: 예술과 상업의 틈에서 나만의 균형점을 만들다 22 [Creator+] 비주얼 아티스트 연여인: 예술과 상업의 틈에서 나만의 균형점을 만들다](https://design.co.kr/wp-content/uploads/2025/08/20250820_08254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