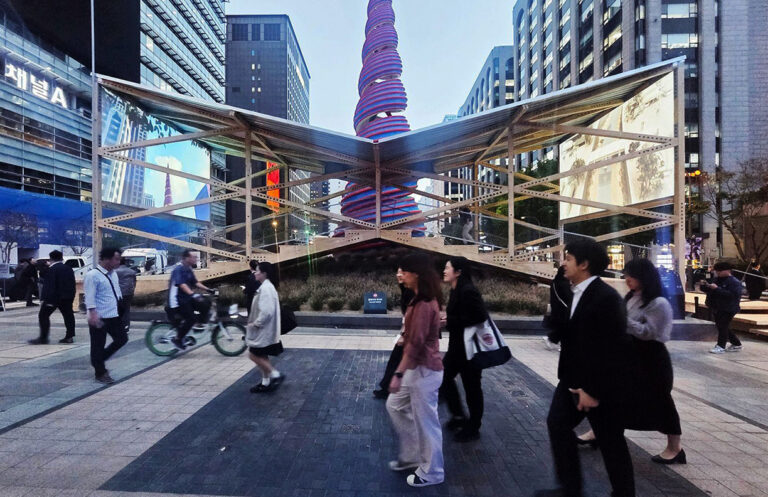업의 변화를 함축하는 오피스 디자인 – 1
호모 라보란스의 유토피아 워크 디자인 4.0
과거부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업무 환경'을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날의 오피스 디자인은 그 자체로 업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고, 그곳의 역사를 탐색하는 일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과 같다. 산업의 변화부터 노동하는 인간이라는 유토피아까지, 오피스 디자인의 변천사를 소개한다.

요즘만큼 일 자체가 화두로 떠오른 시대가 또 있었을까? 산업혁명 이후 줄곧 장밋빛 미래를 약속해주었던 기술 혁신은 이제 힘을 다한 모습이다. 본격화된 경제 저성장은 고용 불안정을 낳았고 인구 감소와 고령 사회의 도래는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놓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의 확산은 사회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인공지능 기술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는 우려까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기회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찾아오는 법. 현명한 자세와 태도로 변화하는 시대정신을 살펴보면 지금의 격변기는 또 다른 가능성이 될 수 있다. 이에 그 출발선으로 우리 주변의 오피스 디자인을 둘러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오피스 디자인은 구 본사의 미끄럼틀 같은 인테리어를 뜻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오피스 디자인은 그 자체로 업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으며 일의 미래를 제시하는 지향점이기도 하다. 스마트해진 기업의 오피스 디자인부터 창조적인 이합집산, 공유 사무실의 디자인까지. ‘어떻게 하면 더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들에게 인사이트를 줄 만한 오피스 디자인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호모 라보란스의 유토피아 워크 디자인 4.0
“단순하고 진정성 있는 건물이기만 하다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1906년 뉴욕의 라킨Larkin 본사 건물을 완성하고 남긴 말이다. 그런데 사실 이 한 문장 안에는 수많은 회색 지대가 존재한다. ‘진정성 있는 건물이란 무엇인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축복이란 높은 업무 효율성을 말하는가, 아니면 풍요로운 사내 편의 시설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들 말이다. 오피스 디자인의 역사는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오피스 디자인의 변천사는 산업의 중심축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노동하는 인간homo laborans의 유토피아가 어떻게 생성됐는지를 보여준다.
공장을 모태로 태어난 현대 오피스
오피스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한다. 중세 수도원이나 도서관, 학자의 서재도 엄한 의미에서 보면 모두 사무 공간이었다고 할 수 있다.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 역시 본래 메디치 가문이 회계 업무를 보기 위해 지은 일종의 사무실이었다. 하지만 현대적 의미의 사무실이 탄생한 것은 산업혁명 즈음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제조 기술의 발달로 인류는 유례없는 생산성 향상을 이룩했지만 체계는 규모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곳곳에서 노동쟁의가 빈번히 일어났고 감독관들은 노동자에게 어떤 지시를 내려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프레더릭 테일러Frederick Taylor다. 효율성을 신봉했던 그는 여러 논문에서 노동자들을 따로따로 관찰, 연구,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노동자의 행동 패턴을 체계화할 수 있도록 스톱워치 전문가를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톱워치 전문가란 말 그대로 노동자 옆에 스톱워치를 들고 서서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행동별로 기록하는 사람을 뜻한다. 처음에는 다들 괴팍하고 기이한 발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차츰 그를 따르는 무리가 생겼고 이른바 테일러리즘을 수용하는 회사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해지자 불과 몇 명 단위로 이뤄지던 초기 사무실이 수백 명을 수용하는 사무실로 진화하게 되었다. 1860년 미국의 전문 서비스직 종사자는 75만 명에 불과했지만 1890년에는 216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유럽과 미국의 사무실이 거대한 서류의 제국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화이트칼라의 왕국을 건설하다
사무직 노동자의 부상은 당대 건축가들의 관심을 모았다. 그들의 일터인 사무실이, 속속 등장하는 새로운 기술과 건축 재료를 실험해보기에 더없이 좋은 무대기 때문이다. 1871년 증기 엘리베이터를 처음 건물에 적용한 데에 이어 이듬해에는 유압식 엘리베이터를 뉴욕 트리뷴 빌딩에 도입했다. 철골, 유리, 콘크리트 등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소재가 속속 건물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1871년 시카고 대화재는 하나의 구심점이 되었다. 루이스 설리번Louis Sullivan, 윌리엄 르 배런 제니William Le Baron Jenney 등 이른바 시카고학파의 건축가들이 화마가 휩쓸고 간 잿더미 위에 모더니즘 유토피아를 일구기 시작하면서 화이트칼라의 구역이 도시 중심부를 점령해나가기 시작했다.
물론 이런 현상이 벌어진 배경에는 건축가들의 순수한 열망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자본가 계급은 사무직 노동자들이 날로 맹렬해지는 노동운동에 향받는 것을 두려워했다. 특히 19세기 후반 급진적인 무정부주의자들이 시카고 전역을 위협하기 시작하면서 자본가들은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를 격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물리적으로 보자면 모스 전신과 전화기의 보급이 이를 가능케 했다. 하지만 건축가들은 물리적인 격리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다. 이들은 사무 공간에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부여하곤 했는데 이는 사무실이 거칠고 위험한 공장과 구별되는 차원 높은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자 하는 전략이었다. 180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까지 미국에서 고전주의풍 사무 건물이 크게 유행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또한 이 시기에 사내에 각종 부대시설을 마련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휴식이 경의 중요한 일부라는 사실을 깨달은 경진의 배려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무원들이 자신을 거대한 중산층에 속한다고 여기도록 만들기 위한 유인책이기도 했다. 모더니즘 건축가들의 실험은 193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르코르뷔지에, 발터 그로피우스, 미스 반데어로에 등이 이끈 인터내셔널 양식이 고전주의 양식을 대체했는데 이들은 유리와 강철로 이뤄진 고층 건물이야말로 모더니즘 유토피아를 이룩할 새 시대의 언어라고 생각했다. 마침 비슷한 시기에 발명된 에어컨이 유리 커튼월의 치명적 단점인 실내 온도 상승을 보완하면서 유리 외벽 건물이 도시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사무실의 한계는 명확했다. 진보를 거듭한 외관과 달리 공간 디자인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개방과 프라이버시의 시소 게임
플로렌스 슈스트 놀Florence Schust Knoll은 사무실 인테리어의 초석을 다진 선구자였다. 미스 반데어로에의 가르침을 받은 그녀는 바우하우스의 합리성을 건물 내부의 레이아웃에까지 적용시켰다. 그녀는 사무실을 하나의 유기체로 바라봤으며 유럽식 모더니즘 디자인을 미국의 사무실에 안착시키는 데 일조했다. 그녀가 디자인한 보험사 코네티컷 제너럴Connecticut General 건물은 모듈형 가구와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추었다. 또한 이 건물은 친밀하고 우연한 만남(1)이 가능하도록 복도 구조를 기획했는데 이는 현대 오피스와 매우 닮았다. 오피스 인테리어에 대한 관심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완벽히 재편된 산업 체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산업의 주도권이 블루칼라에서 화이트칼라로 넘어온 것이다. 피터 드러커는 ‘지식 노동자’라는 말까지 만들어내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공표했다.
오피스 인테리어 초창기에 크게 각광 받은 것은 오픈 플랜, 즉 개방형 사무실이었다. 1958년 독일의 슈넬레 형제Wolfgang Schnelle & Eberhard Schnelle는 ‘뷔롤란트샤프트Bürolandschaft(사무실 조경이라는 뜻)’라는 시스템을 고안했는데 이동식 파티션과 몇 개의 화분을 제외하고 사무 공간 전체를 개방형으로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책상 배열은 얼핏 어지럽고 무질서하게 보이지만, 사실 치밀하고 정교한 계획의 결과물이었다. 높은 칸막이와 벽에 막혀 답답함을 호소하던 사무직 노동자들에게 뷔롤란트샤프트는 신선한 실험이었고 이는 독일을 넘어 스웨덴, 영국, 미국 등지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개방형 사무실이라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특히 소음 문제가 골칫거리였다. 소통과 개방은 극대화되었지만 집중력을 위한 공간은 마련되지 못했던 것이다. 뷔롤란트샤프트의 뒤를 이어 허먼 밀러Herman Miller사는 획기적인 시스템을 세상에 내놓았다. 1964년 첫선을 보인 액션 오피스Action Office가 바로 그것. 로버트 프롭스트Robert Propst가 고안하고 조지 넬슨George Nelson이 디자인한 이 오피스 시스템은 사무 공간의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프롭스트는 뷔롤란트샤프트의 유연함은 물론 사이버네틱스 이론, 에드워드 T. 홀Edward T. Hall의 근접 공간학 등 사회학과 행동과학을 섭렵해 액션 오피스 안에 녹여냈다.
액션 오피스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을 움직이는 존재로 간주하고 이를 디자인에 적극 반영한다는 것이다. 우연한 만남을 유도하는 이동식 테이블을 마련하되 칸막이로 프라이버시 또한 배려했다. 조지 넬슨은 캔틸레버 구조, 스탠딩 데스크, 다양한 색상을 적재적소에 사용해 완성도를 높였다. 미국의 저술가 니킬 서발Nikil Saval은 이를 두고 “디자인의 미학과 인간 욕구에 대한 진보적 개념이 하나로 융합된 것”이라 평가하기도 했다. 사실 높은 가격대 때문에 액션 오피스 I은 수익 면에서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그 개념만큼은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세간의 평가에 자신을 얻은 허먼 밀러와 프롭스트는 1968년 액션 오피스 II를 출시했다. 3개의 칸막이를 둔각으로 배열한 액션 오피스 II의 워크스테이션은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재구성할 수 있었다. 모듈형 칸막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주고 앉거나 서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작과 달리 액션 오피스 II의 큐브형 사무실은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 뒤를 이어 스틸케이스Steelcase의 9000 시리즈, 플로렌스 슈스트 놀의 차프Zapf 시스템 등 액션 오피스 II와 유사한 형태의 오피스 시스템이 속속 등장하며 그 실효성을 증명해나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피스 구루’ 프롭스트의 선견지명은 점차 악몽으로 변해갔다. 회사들이 액션 오피스 II의 정신은 간과한 채 외형만 복제하듯 도입하면서 큐브형 사무실이 파티션 감옥으로 변질된 것이다. 이른바 큐비클cubicle이 인간을 옥죄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심벌이 되었다. 1980~1990년대 실리콘밸리로 대변되는 테크놀로지 기업의 성장은 사무 공간의 속성을 다시 한번 바꾸어놓았다. 닷컴 기업을 일군 프로그래머들은 기존의 보수적인 직장인들과는 사뭇 달랐다. 그들이 신봉한 반문화적 기질(스티브 잡스를 생각해보라)은 신경제와 만나 기묘한 시너지를 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성향은 사무 공간에도 고스란히 적용되었다. 당시 그들의 오피스는 느슨하고 체계가 없어 보였는데 체계화라는 차원에서의 디자인이 그들에게 적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규격화, 통일성 같은 개념은 처분해야 할 낡은 관념이었다.
오늘날 스타트업이 그러하듯 당시의 IT 회사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장과 확장이었다. 유연하고 느슨하며 조직의 빠른 성장에 대처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 필요했고 사무 공간은 자연스레 이에 맞춰 진화했다. 어쩌면 이전보다 더 영악해지고 정교해진 디자인이라고도 볼 수 있었다. 일과 삶의 경계가 불분명한 닷컴 회사 직원들을 고려해 회사는 점차 캠퍼스화되었다. 사내 편의 시설은 기존 제조사보다 대폭 확충되었다. 허먼 밀러사의 에어론 체어Aeron Chair가 본래 요양원 노인을 위한 욕창 방지용 의자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장기간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어야 하는 엔지니어의 필요에 맞게 변형함으로써 이 디자인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다. 오픈 플랜은 그렇게 다시 한번 시대의 정신이 되었고 닷컴 회사들의 오피스 실험은 2000년 나스닥 붕괴 직전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개방과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핑퐁 게임을 하던 사무실 디자인은 21세기에 들어와 또 한 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1) 흔히 ‘세렌디피티적 만남’이라고 하는데, 20세기 중반 미국의 경영진은 평소 마주칠 일 없는 부서 사람들이 우연한 기회에 마주함으로써 창의적 결과가 탄생하길 원했다. 트랜지스터와 비트 단위를 탄생시킨 AT&T의 벨Bell 연구소가 대표적인 공간이다.
(2) 부서 간 협력이나 소통 없이 고립된 조직이 되어 회사 전체의 비효율성과 고비용을 발생시키는 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