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싱키 창작 허브 ‘로칼’이 반한 한국의 공예·디자인은?
로칼 x 팩토리2 교류전, <조응>
핀란드 헬싱키의 창작 허브 '로칼(LOKAL)'과 서울의 예술공간 '팩토리2'의 교류전이 열리고 있다. 한국과 핀란드 작가 각 5인의 작품을 소개하는 전시 <조응>은 그 제목처럼 서로의 작품이 손 편지를 주고받듯 조용하게 어우러지는 점이 인상적이다.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자리한 예술공간 팩토리2에서 핀란드의 갤러리 로칼(LOKAL)이 함께 기획한 교류전 <조응(Correspondences)>이 지난 11월 2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각기 다른 자연 소재를 사용하는 핀란드와 한국의 작가 각 5인이 작품을 선보인다. 로칼 설립자이자 사진가인 카티야 하겔스탐(Katja Hagelstam)과 인테리어 건축가 한니 코로마(Hanni Koroma)가 재해석한 팩토리2 공간 안에서 서로의 작품 세계가 손 편지를 주고받듯 조용하게 조응하는데, 이를 통해 전시는 예술적 공동체로 기능하며 관객을 교감의 장으로 초대한다.

두 공간이 상호 간 협력해 전시를 선보이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팩토리2와 로칼은 몇 차례 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2016년 타이포그래피, 디자인, 예술, 공예를 결합한 전시 <타이포크라프트 헬싱키>의 서울 에디션이 그 시작이다. 이후 2017년에 헬싱키와 교토에서 같은 시리즈의 기획전을 개최하며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혔다. 심지어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이들은 협력의 끈을 놓지 않았다. 2021년 로칼의 대표 전시 <Coming Home>(2021)을 팩토리2에서 선보였고, 이듬해에는 유리공예 작가 레나타 쉬름(Renata Schirm)의 개인전 <MYRIAD>(2022)까지 공동 기획해 소개했다. 로칼과 팩토리2는 가변적인 조건과 환경에 발맞춰 협업의 방식을 다채롭게 변주해 왔고 이번 전시 또한 그 궤를 같이한다.
‘로칼’과 ‘팩토리2’가 협업하는 이유
서울과 헬싱키의 거리는 약 6,990km 떨어져 있다. 물리적 거리가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두 도시 간의 거리감은 여전히 상당하다. 헬싱키의 로칼과 서울의 팩토리2 두 공간이 함께 협업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이에 관해서 로칼의 설립자이자 이번 전시 <조응>을 기획한 큐레이터 카티야 하겔스탐은 이렇게 말한다. “팩토리2와 로칼의 협업은 단순히 한국 공예나 디자인 신(scene)에 관한 관심에서 비롯된 건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갤러리와 공간은 정말 많고, 각 장르를 대표하는 곳들도 셀 수 없이 많죠. 하지만 팩토리2는 그중에서도 로칼과 아주 비슷한 결을 지닌 특별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로칼은 2012년 헬싱키 중심에 자리한 디자인 디스트릭트에 문을 열었다. 사진가로 활동한 카티야 하겔스탐이 설립했고, 헬싱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 디자이너, 공예가의 작업을 꾸준히 소개해 왔다. 예술과 디자인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며 고유의 미감과 크래프트맨십으로 핀란드 정부가 수여하는 디자인 상을 2017년에 수상하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디자인 애호가라면 헬싱키를 방문했을 때 반드시 들려야 하는 곳으로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에도 적극적이며 로컬 디자인 신에 끼치는 영향력도 그만큼 상당하다. 크리에이터 사이에서는 로칼을 ‘집(Koti)’이라고 부를 정도라고. 전시 공간과 아트숍을 겸한 갤러리 팩토리를 전신으로 한 ‘팩토리2’ 또한 시각예술 지형도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며 독자적인 미감과 공예적 태도로 창작자들을 발굴해 왔다. 시각예술, 디자인, 공예의 경계를 유연하게 넘나들며 서울을 넘어 국내 창작자 생태계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 부분 로칼의 행보와도 닮다.
카티야 하겔스탐은 “두 공간 모두 예술적이면서도 장르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가를 발굴하고, 손으로 만드는 행위에 집중하는 작업을 중요하게 여기죠. 팩토리2는 단순히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공예와 예술, 디자인의 교차점에서 독특한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런 점에서 로칼의 성격과 정체성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죠. 팩토리2와 다양한 형태로 함께 하는 협업 활동은 서로에게 의미가 깊은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공예와 예술의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창작의 가능성을 확장하고, 손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회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팩토리2와의 지속적인 협업에 대한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핀란드인이 바라본 한국의 공예는?

이번 전시에서는 백경원, 양정모, 정수경, 차승언, 현명아 한국 작가 및 공예가 5인과 안트레이 하르티카이넨, 한니 코로마, 헬리 투오리-루토넨, 밀라 바흐테라, 나탈리 로텐바허 등 핀란드 출신의 작가 5인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는 핀란드 헬싱키의 공예적 태도와 미감뿐만 아니라 핀란드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의 공예와 디자인 매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롭다.
한국의 공예와 디자인 신은 정말 매력적입니다. 특히 현대 공예에서 핀란드와 한국이 공유하는 미학적인 공통점이 눈에 띄어요. 예를 들어, 두 나라 모두 단순함을 중요하게 여기고 자연을 작품에 담아내는 방식이 아주 비슷하죠. 이러한 자연스러움이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는 점도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핀란드에서도 공예는 단순한 실용성을 넘어선 미학적 경험으로 여겨지는데요. 한국의 공예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공감됩니다. 이번 전시에서 이러한 현대 공예의 맥락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카티야 하겔스탐, 로칼(LOKAL) 창립자


시카고 예술대학 프린트 미디어 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현명아 작가는 다양한 혼합 매체를 사용해 ‘연결’이라는 개념을 표현한 작품을 소개한다. 작가는 일상에서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요소를 결합해 관객이 작품과 직접 연결되어 상호작용을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다. ‘연결’이라는 단어를 비유적으로, 또 문자적으로 탐구하며 관객과 작품이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가는 것이 작가의 작품 세계 핵심이다. 그 매개체가 바로 아티스트 북인데 전통적 제본 방식과 혁신적인 방법을 결합해 신선한 경험을 선사하는 점이 특징이다.

전시장에서 만난 차승언 작가의 작품은 회화처럼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직조한 직물로 구성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작가는 홍익대학교에서 섬유미술을 전공하고 시카고 예술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베틀을 이용해 짠 캔버스를 통해 한국과 서구의 근대 추상회화를 참조해 직조 기법으로 새로운 회화를 선보인다. 실을 염색하거나 혹은 색실을 이용해 무늬를 만들어 캔버스를 짜고 그 위에 페인팅을 더하는 작업 과정은 수공예적 노동과 시간의 가치를 재고한다. 그렇게 완성된 작품은 현대미술과 공예,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시각과 촉각, 정신과 물질 등 상반된 개념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작가의 실험적 태도를 내포하고 있다.


정수경 작가는 건축의 기하학적 구조와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유리 조형 작업을 선보인다. 캐스팅 기법으로 색유리 블록을 열로 결합하는데 고체와 액체의 경계에 있는 색유리 블록의 독특한 물질성이 특징이다. 이는 특정 배열로 몰드에 배치 후 가마 속에서 열성형 과정을 거친 결과물로 작품의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한다. 규칙과 우연, 정형과 비정형을 동시에 담은 작품은 복잡하면서도 반복적인 패턴 속에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 지점이다.


(오른쪽) 공예와 산업 디자인을 기반으로 가구 및 조명 디자인을 제작해 온 양정모 작가의 작품. Grid 01, 2023, Hanji, bamboo, Ø 60 × H 58 cm ©양정모 스튜디오 Studio Jungmo Yang
도예가 백경원 작가가 핸드 빌딩 기법으로 만든 도자기와 한지를 반복적으로 붙여 만든 조명 디자인을 선보이는 양정모 작가의 작품도 이번 전시에서 만날 수 있다. 두 작품 모두 손을 사용해 만든다는 점에서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 카티야 하겔스탐의 기획 의도에도 잘 부합하는 모습이다.



한니 코로마의 가구 디자인 작품 Protecting Wings, 2024, Oak, 40 × 20 × 35 cm
헬리 투오리-루토넨의 섬유 작품, Seamless series, 2024, linen, woven freely in one piece, 100 × 20 × 20 cm
한 공간에서 한국의 공예 작가들의 작품과 조용하게 조응하는 핀란드 작가들의 작품도 놓칠 수 없다. 핀란드 가구 브랜드 피스카스(Fiskars)에서 목재 가구 작업을 선보이는 장인이자 디자이너 안트레이 하르티카이넨(Antrei Hartikainen)은 나무라는 재료에서 얻은 영감을 유기적 형태의 작품으로 선보인다. 이번 전시의 공간을 연출한 한니 코로마(Hanni Koroma)는 지속 가능하고 유쾌한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한 가구 디자인을 소개하며, 건축적 특성을 미니멀한 방식으로 표현한 섬유 예술가 헬리 투오리-루토넨(Heli Tuori-Luutonen)의 작품도 만날 수 있다.


(오른쪽) 나탈리 로텐바허의 테이블웨어 컬렉션. MORNING (Aamuyöstä), 2023, Colored slip cast porcelain and glaze, metal plate, 18 × 18 cm
유리 덩어리 조각과 황동을 결합한 개성 있는 작품을 선보이는 밀라 바흐테라(Milla Vaahtera)도 이번 전시에 참여했다. 글라스 블로어(유리공) 제작 과정의 즉흥성을 바탕으로 작품의 균형감과 긴장감을 조율하는데 섹슈얼리부터 직관과 협업에 이르는 다채로운 주제를 표현한 작품 세계를 다룬다. 도예가이자 디자이너인 나탈리 로텐바허(Nathalie Lautenbacher)의 테이블웨어 컬렉션도 함께 자리한다. 섬세한 색과 미묘한 형태로 개성 넘치는 작업을 만날 수 있다. 이처럼 한국과 핀란드 각각의 참여 작가는 재료, 장르, 제작 방식이 서로 맞닿아 있다. 작품 간의 차이와 공통점을 살펴보는 것도 이번 전시의 매력이다.
핀란드 인테리어 건축가가 재해석한 전시 공간
한편, 팩토리2와 로칼이 협업해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바로 전시 공간 디자인이다. 큐레이터 카티야 하겔스탐과 함께 인테리어 건축가로 활동해 온 한니 코로마(Hanni Koroma)가 팩토리2 공간을 독자적인 시선으로 재해석해 선보인다. 한니 코로마는 그간 개인 주택, 사무실, 부티크, 레스토랑, 공공 공간 등 200여 개가 넘는 공간을 디자인해 왔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공간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한 편의 시와도 같다. 따라서 한니 코로마의 디자인은 항상 더 큰 개체의 일부로 문화와 시대의 변화와 대화하는 듯한 성격을 지니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전시를 위한 전시 공간 디자인으로 그녀는 공간의 스케일과 색채를 강조했다. 팩토리2 공간의 크기와 비율뿐만 아니라 외부와의 연결성까지 고민했다고. “관람객이 자연스럽게 공간 안으로 이끌리면서도 팩토리2의 바깥 풍경과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고자 했습니다. 공간이 단절되지 않고 확장될 수 있는 느낌을 주는 것이 이번 디자인의 핵심 중 하나죠.” 공간을 단순히 탈바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무대로서 연출한 한니 코로마의 말이다.


전시 공간 중앙에는 회색 톤을 지닌 전시대가 자리한다. 바닥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마치 작품들이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며 강조된 모습이다. 한니 코로마는 공간 속 색채가 작품을 돋보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다. 색채를 통해 공간 자체를 작품과 관람객의 연결 고리로 만든 셈이다.
팩토리2의 큰 통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도 전시 공간을 디자인할 때 주요하게 고려한 요소다. 시간에 따라 달리 들어오는 빛은 공간과 작품에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낸다. 자연광과 회색 톤이 조화를 이루며 작품의 디테일을 부각할 수 있도록 색감을 신중하게 조율했다. 이를 통해 관람객에게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선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한다.
한니 코로마는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공간이 작품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강조한다. “공간은 언제까지나 좋은 배경일 뿐이에요. 전시의 주인공은 각각 고유한 세계를 담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입니다. 관람객분들이 공간에 압도되기보다 작품이 지닌 독창적인 이야기와 세계를 눈여겨 봐주셨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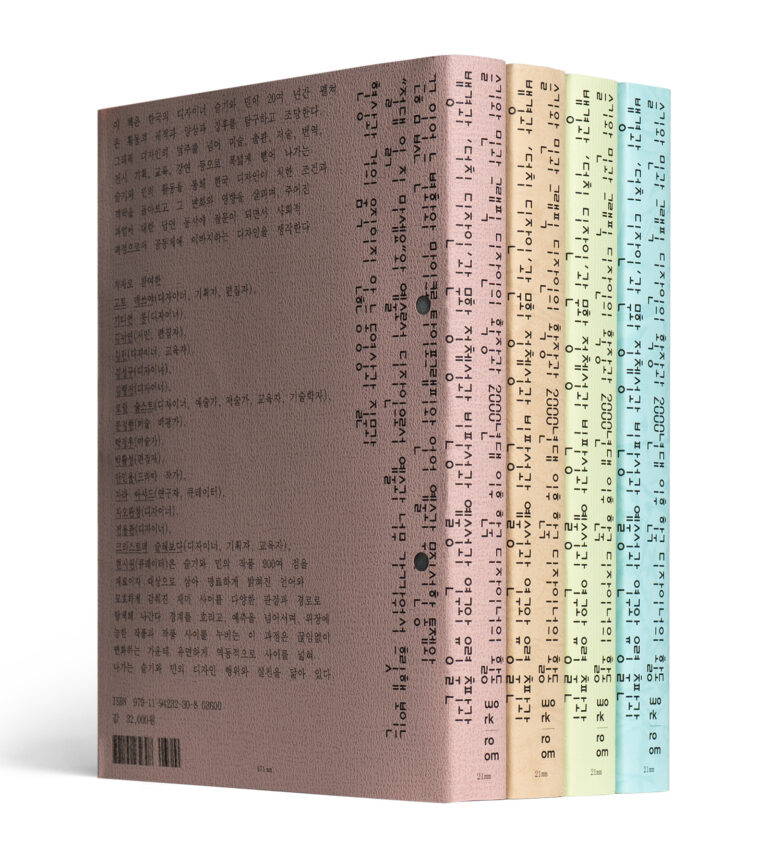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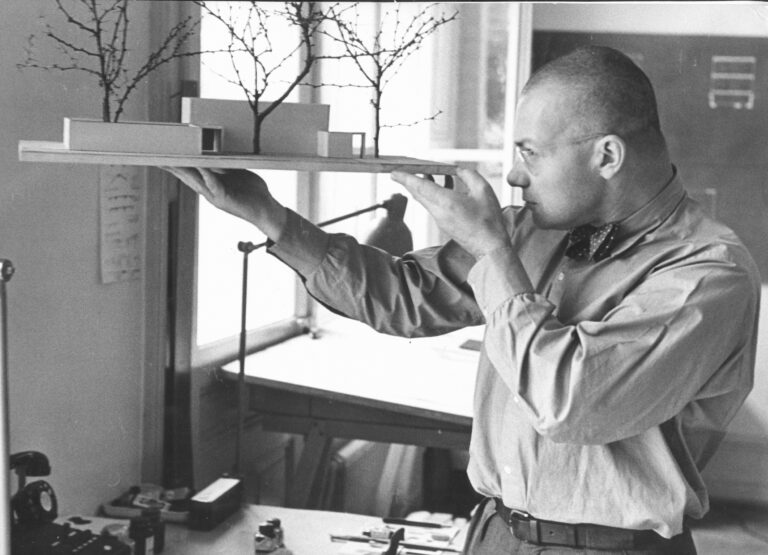
![[Creator+] 미소바케카케 손규리 디자이너: 이야기를 재료로 케이크를 디자인하다 26 [Creator+] 미소바케카케 손규리 디자이너: 이야기를 재료로 케이크를 디자인하다](https://design.co.kr/wp-content/uploads/2025/12/20251210_062233.jpg)